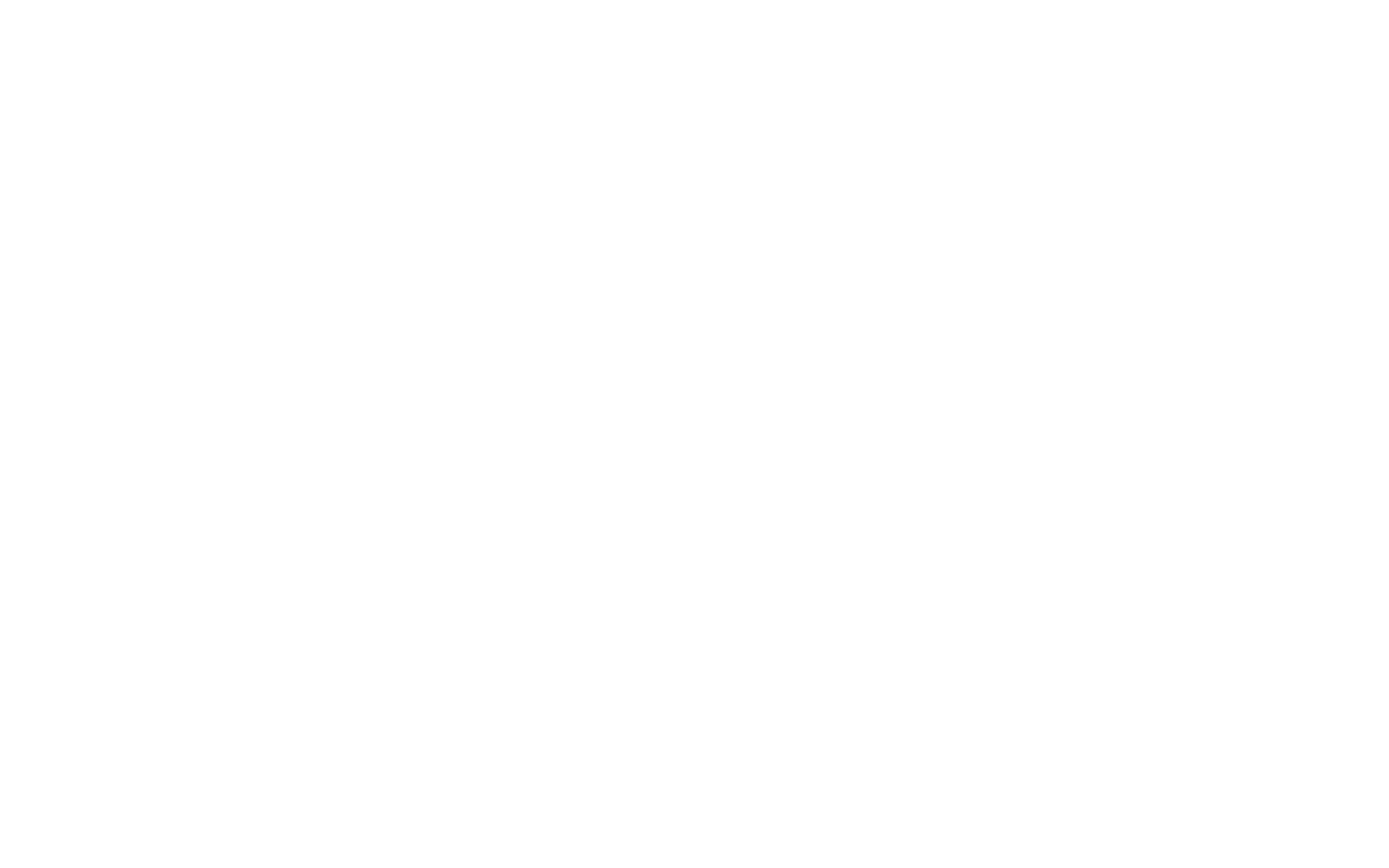시네마테크- 진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
세상 모든 영화 2009. 3. 1. 04:20 |
대학교 1학년, 나는 좋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우연히 인터넷 어느 게시판에서, 음습한 돼지머리고기집을 지나면 진짜 영화를 틀어주는 악기상가가 있다는 글을 봤다. 대부분의 멋진 것들을 경험할 때 그러하듯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곳에 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어렵게 시간과 마음을 내서 간 그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는 자크 투르뇌르의 <나는 좀비와 함께 걸었다> 였다. 자크 투르뇌르가 어떤 감독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물론 지금도 잘 모른다) 그 영화는 매우 기묘하고 모호해서 보는 내내 물음이 더 많았었다. 그리고 상영이 끝나고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을 그 극장에서 만나 매우 쑥스럽게-하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해 뿌듯한-인사를 했었다.
고백하건대 그 때의 그 관람은 영화에 대한, 혹은 더 지적인 문화에 대한 허영이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비내리는 흑백필름을 공부하듯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고전 영화를 보고 있구나, 이런 멋진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뿌듯해 하고 있었다. 초자연적인 힘과 신비하게 빛나던 하얀 드레스, 흑인의 검은 얼굴에 박힌 의심가득한 흰 눈이 주는 강렬한 미쟝센을 그 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그 허영은 점차 '필름에 대한 매혹'으로 바뀌었다. 나는 오래된 필름이 만든 잡음과 스크래치, 필터를 써서 뿌옇게 빛나는 하얀 빛과 검은 그림자가 물결치는 오래된 필름을 보았다. 그것은 영화보기가 무엇인지, 시간을 초월해 셀룰로이드에 조각한 빛이 영사될 때 얼마나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영화보기가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다. 이야기가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시간을 가공해 넣은 필름이 빛에 의해 복원되는 감동이 영화라는 것을 배웠다.
그 뒤로 시네마테크-서울아트시네마는 나에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거기에서 나는 빌리 와일더와 진 켈리가 보여준 스크루볼 코메디에 웃었고, 봉준호와 홍상수 감독의 팬이 되었다. 40-50년대 헐리우드 영화가 얼마나 재치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스탠리 큐브릭과 이안 그리고 허우 샤오시엔을 만났다. 영화보기가 지겨워 질 때, 볼 영화가 없을 때, 그곳은 언제나 나에게 발견이었고 배움이었다.
그런 서울아트시네마가, 흔들리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사실 나는 서울아트시네마의 정체성이나 관련된 지원 정책같은 것들을 잘 모른다.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 그 공간을 '일부' 지원하는 단체에 의해 무너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에 의해서 공모제를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행하는 이런 과정은, 건강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시네마테크의 공모제 전환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시네마테크의 후원인이 되고, 시네마테크를 더 자주 찾는 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가능한 열심히 할 생각이다. 나는 비록 서울아트시네마의 처음부터 함께 한 사람도 아니고 시네마테크의 가족이라고 말할 만큼 오래 머무른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빛나는 시간의 세례를 받은 영화들을 보고싶다. 평생.
"어제도 오늘도 서울아트시네마
그냥 여기서 살고싶다. 오래된 영화들이랑"
2008.06.16
서울아트시네마 온라인 홈페이지
시네마테크의 공모제 전환 반대 서명페이지
'세상 모든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영화제 : 오브젝티파이드 + 헬베티카 (4) | 2009.07.30 |
|---|---|
| 제13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0) | 2009.07.25 |
| 애프터 미드나잇(Dopo mezzanotte, 2004) (3) | 2009.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