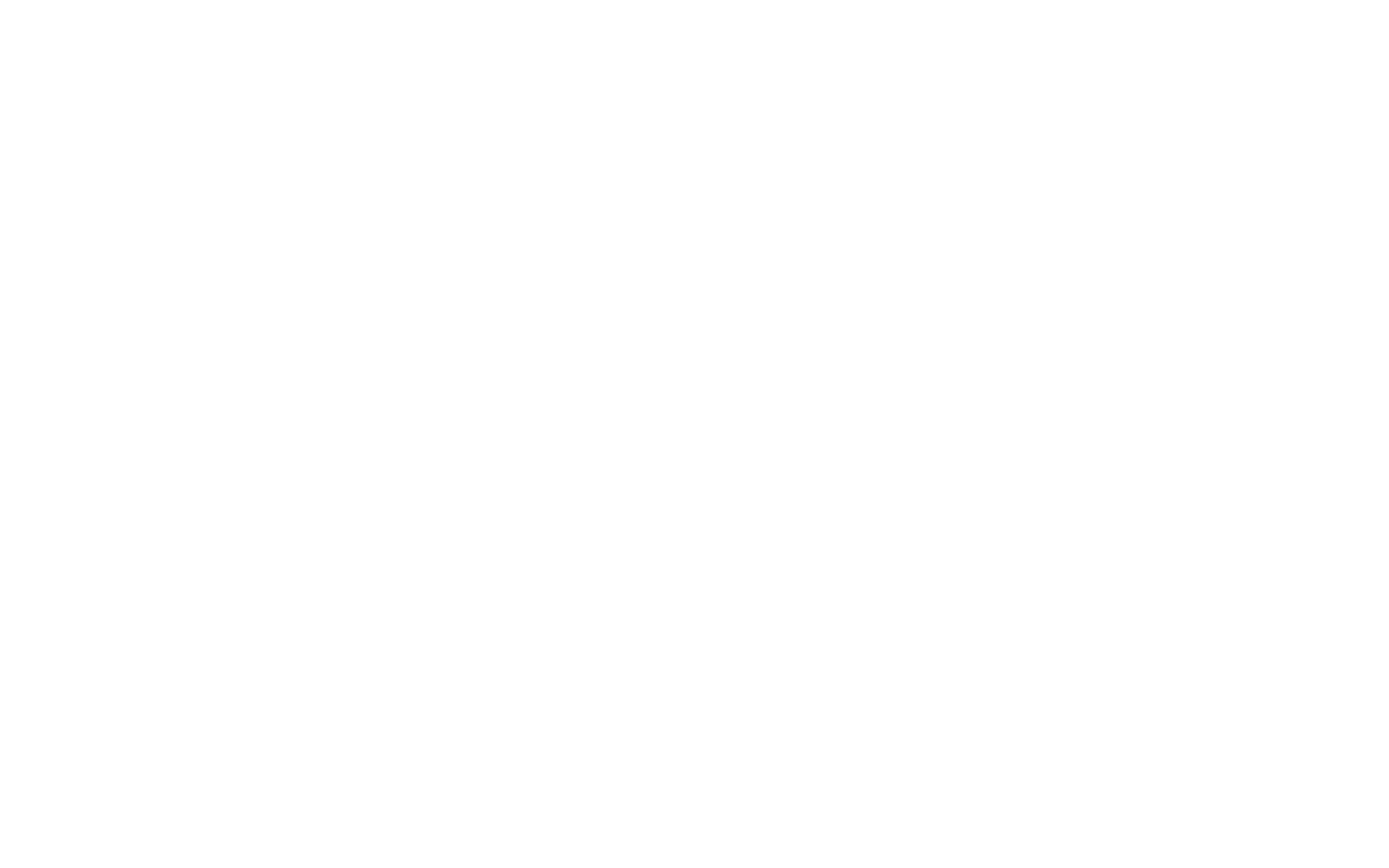이터널 선샤인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2004)
세상 모든 영화 2010. 1. 20. 11:15 |<Eternal Sunshine of the Spotless Mind>

(줄거리,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영화평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나는 원래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 말에 힘을 주기 위해, 십년이 넘은 친구 이름도 헷갈리곤 해서 그는 내 기억력에 대해서는 이미 달관했다는, 물어보지도 않은 에피소드를 이어서 늘어놓곤 한다. 좋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행복한 순간에도 금새 잊혀질 거라는 불안감이 앞서곤 한다. 좋았던 시간,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함께 있을 때, 혹은 서로의 꿈이나 이상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의 찬 공기 같은 것들은 감촉만 남고 금새 증발된다. 진부한 문장들만 남는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기억력이 좋건 나쁘건, 잊혀져 가는 것은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는 누구에게나 유효한가 보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꼽는 걸 보면 사람의 감성이 이렇게 보편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정말 특별하지 않은 존재구나 싶기도 하다.

극장에서, 필름으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영화다. 나중에서야 영화를 보고 썼던 짧은 감상을 다시 찾아보니 “영화가 너무 좋다, 라는 느낌은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제쳐두더라도, 이렇게 놓치는 영화가 정말 산처럼 많을 거라는 가벼운 공포를 동반했다.”고 되어있다. 그 때 기억이 난다. 당시는 지금 내가 보거나 읽거나 느끼거나 흡수하지 못한 채 지나쳐버리는 것들에 대한 강박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나는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데미안>도 읽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무서웠다. 겅중겅중 팔다리를 성인의 그것처럼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했고, 유치원에서 ‘기억력’에 대한 수업이 있을 때 꾀병을 부리고 집에서 누워있다가 기억의 기능이 덜 개발된 채 자라버린 게 아닐까 두려웠다.
영화가 ‘좋았다’는 기억만 남은 채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영화 외적으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생생했다. 심지어 나는 미니홈피 사진첩에 “존재에 감사합니다.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터널 선샤인>을 가장 처음으로 꼽았던 것이다. 왜 이렇게 좋아했지? 무섭다. 이렇게 사라져가는 좋은 순간들. 뭐지? 그 영화 어떻게 좋았던 거지?
“나다의 마지막 프로포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필름으로 볼 수 있었다. 오래간만에 보는 영화는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로웠고, 미소를 짓게 하는 장면들도 아픈 장면들도 마음 두드리는 장면들도 다 좋았다.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 서로의 개인적인 기억들과 생각들, 감상들이 뒤섞였다. 자리가 편하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좋게 기억되겠구나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다.
서로가 힘들어 해서 좋지 않게 되어버린 결말을 가지고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영화의 마지막을 향했다. 모두가 같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아주 개인적인 자신의 기억을 밀하고 있었다. 재미있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르익은 뒤 그게 힘들어져서 이별하는 과정을 아직 겪지 않았다. 겪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말하기가 꺼려지는 요즘이라 입을 닫고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로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가지는 철없는 낭만, 혹은 낙관적인 태도가 눈에 들어왔다. 한 친구가 지적했다. 매리(커스틴 던스트)의 행동이 모든 커플을 다시 맺어줄 수 있었을까? 그게 좋은 행동이었을까? 상대에 대한 감정의 끝을 보고 그대로 돌아서 ‘기억을 지울 정도로 안 좋았다’는 사실마저 기억하게 되거나, 혹은 죽음이나 짝사랑 같은 일방적인 이별을 ‘다시’ 깨닫고 더 큰 슬픔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영화는 다시 하워드 박사(톰 윌킨슨)를 사랑하게 되는 매리(커스틴 던스트)나 다시 시작해보자며 웃어 보이는 조엘(짐 캐리)과 클레멘타인(케이트 윈슬렛)을 통해 어떤 낙관을 꿈꾸는 것 같았다. 미셸 공드리의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몸은 성인이지만 아직 아이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자 주인공이 꿈꾸는 어리고 풋풋한 로망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어떤 운명이나 결정지어진 사랑에 대한 소년의 로망이 느껴졌어. 영화는 이 설정으로부터 갈라져 나올 수 있는 수 많은 상황과 이야기들 중에 세심하게 낙관적인 행복을 골라내잖아. 그래도 다시 시작 하려는 사람들의 사랑들을 그려내고 있으니까. 아프지만 희망이 느껴졌어.” 이런 저런 대화 끝에 나도 한 마디쯤 해야 할 것 같아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풀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미안하다는 듯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명이나 로망이라기보다는 기억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영화를 감독의 시각에서 보려고 했다면 그는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에 온전히 비추어 본 다음에 신중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생각 그 친구의 생각 중에 누가 옳고 틀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성급했구나 혹은 내가 얕게 생각하고 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나의 형편없는 기억력은 굳이 라쿠나를 찾아가지 않아도 좋은 기억들을 너무나 빠르게 지워나가고 있었지만, 그래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을 거야. 위로 받는 느낌이 들었다. 문자를 보냈다.
“오면서 생각해 봤는데, 운명이라는 건 성급한 단어였던 거 같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대한 게, 그래서 둘이 다시 만나게 되고 매리가 하워드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거 같아. 좋은 이야기 고마워.”

4년 전에 내가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좋아했던 이유는 ‘지워버린 기억’처럼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보고 ‘좋았던 느낌’은 쉽게 잊혀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 마음에 남아있다. 인생에 대한 참으로 근사한 위로를 받는다.

(저작권 : 포스팅에 쓰인 사진은 영화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스틸컷입니다.)
'세상 모든 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주국제영화제 (2) | 2010.04.03 |
|---|---|
| 올해의 기대작! 500 Days of Summer + Where The Wild Things Are (6) | 2009.08.17 |
| 픽사의 열번째 장편, <업> (4) | 200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