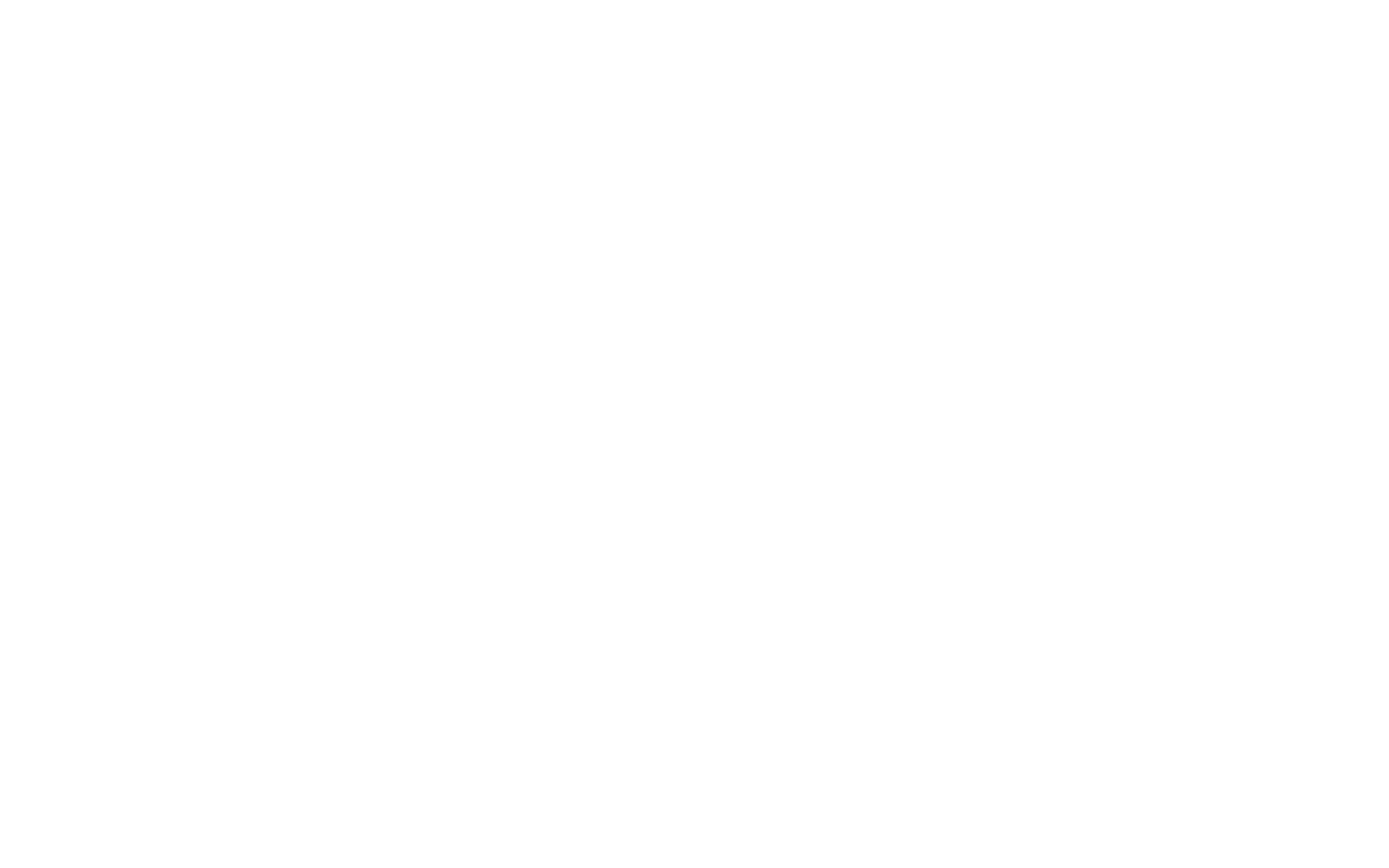아이슬란드 여행기 4
로드무비 2009. 11. 3. 08:07 |# 2009년 8월 23일. 아이슬란드 넷째 날
알람이 채 울리기도 전에 일어났다. 여행을 떠난 이후로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 하지만 날짜를 헤아려 보니 여행을 시작한지 겨우 4일이 지났을 뿐이었다. 하루하루가 길고 먼 여정으로 느껴졌다.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가기 전에는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늦게 일어나 동네를 산책 하면서 지냈다. 오늘 어디를 걸었는지 기록해 두지 않으면 며칠 뒤에는 까맣게 잊게 되는, 조금 느슨하고 긴장이 없던 날들이었다. 오후의 놀이터 같았던 그 날들이 좋았다. 나에게 흔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흔하지 않을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반면 여행의 날들은 하루하루가 선명했고 놀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져, 삼일 혹은 사일을 깨 있는 것만 같았다.
침낭을 다시 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공기가 잔뜩 들어간 침낭을 힘겹게 말아 비닐 집에 넣고, 아빠가 혹시 모른다며 챙겨주신 신발 끈으로 배낭 위에 얹어 고정했다. 침낭은 내 머리 바로 뒤에서 덜렁거리면서, 걸을 때마다 무게중심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뷔욕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러브 엑츄얼리>의 나탈리처럼 기분 좋아지는 미소로 이것저것 알려줬던 검은 머리의 예쁜 스텝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인사했다. 새로 탄 9번 버스 운전기사가 음료를 마시는 건 상관없지만 먹으면 안 된단다. 이참에 아침 값이나 절약하는 거지 뭐, 하며 빈속을 달랬다.
론리플래닛을 뒤적거리며 다음 여행지를 점검했다. 12시 10분에 Egilsstaðir에 도착하면, 패스포트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710번 버스를 타고 Seyðisfjörður에 갈 작정이었다. EastFjords중에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고, 멋진 곳이라는 격찬에 가까운 설명도 매력적이었지만, tranquil lagoon을 둘러보는 night kayaking trip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보고 싶어졌다. 버스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조금 불안했지만, 지금 불안해도 전혀 손 쓸 도리가 없을 때는 그냥 잊고 지금의 여정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걸 Skaftafell에서 일찍이 배웠다.

해안가를 따라 이동하는 9번 버스를 통해 바라보는 풍경은 지루할 틈이 없었다.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이래로 처음 동굴 같이 좁은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걸까? 완만하게 돌아가는 길이 대부분이었다.) 안개가 가득한 산을 돌아가기도 한다. 양 무리들이 모두 길을 건널 때 까지 차를 멈추고 기다리는 이들의 삶이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따뜻해 보이기도 해서 기분이 흐뭇했다. 재주소년,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참을 달렸다. 여행가기 전, 전주영화제 일이 끝나고 본 <박쥐>의 엔딩 같은 해변가도 지나쳤다. 그 영화의 엔딩은 너무 CG가 강해서 인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구름이 만들어내는 바다 위의 그림자, 검은 모래자갈, 거센 파도와 빛이 만들어내는 바다를 보니 그 장면이 허구는 아니었구나 싶어서 놀랐다.
Egilsstaðir에 도착해 안내데스크에 가니, 수많은 책자들과 전단지가 서로 다른 버스시간표를 소개하고 있었다. 안되겠다 싶어 스탭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Seyðisfjörður 가는 버스가 없단다.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거기 가는 버스 없어.”
친절하게 내 버스 스케쥴 책자에 평일 운행시간표를 적어줬지만, 이미 크게 실망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한 시간 뒤에 있는 버스를 타고 아이슬란드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루 이 곳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버스를 타고 Seyðisfjörður으로 가야했다. 여기에서 하루, 도착해서 하루, 돌아오는 하루... Seyðisfjörður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일지, night kayaking이 얼마나 인상적인 경험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그냥 지나쳐 가기로 했다. 전체 여정에 비해 너무 일찍 아이슬란드의 북부에 도착하는 것 같아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한 방을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내 인생을 지금 이 세상에 맞춰야 한다.
여행을 마치고 아이슬란드를 떠나면서, 그 날의 결정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다. 그 선택의 결과 생각보다 아이슬란드의 큰 도시(Akureyri와 Reykjavik)에서 보내는 날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 곳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도 좋았지만, 하루 기다려 Seyðisfjörður에 갔더라면 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여행은 A와 B를 놓고 그 뒤에 이어질 결말을 헤아려 본 뒤에 선택할 수 없고, 일단 선택을 하고 둘 중에 하나로부터 이어진 결말을 따라가야 한다. 나는 선택 너머의 결과들을 저울질 하고 선택을 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나의 가치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책임도 져야 하는 선택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선택도 있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62a번 버스를 타고 Mývatn지역의 Reykjahlíð에 가기로 했다. 얼른 론리플래닛을 뒤져보니 Mývatn호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행지로 연결되기도 하고, 아이슬란드 중부(빙하와 산악지대로 가득한 진짜 모험의 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결국 빙하지대인 중부로는 가지 못했다. 나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았던 Mývatn스탭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싸고, 이미 시즌이 끝났거나 아직 오지 않았던 데다가 2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었기 때문이다.
Seyðisfjörður에 가는 버스도 없고 하루를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소비한데다가 Mývatn 호수를 바라보는 저렴한 숙소는 꽉 찼다며 자리가 없다고 거절당하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며 도착한 마을 반대편에 있는 캠프 사이트에서 (론리플래닛에는 2000Ikr이라던 슬리핑백 사이트를) 4000Ikr이나 요구하자 기분은 더 좋지 않아졌다. 너무 비싸고 좋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Höfn에서 하루 더 머물 걸.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



짐을 풀고 숙소를 나서는데 하늘이며 바람조차 심상치 않았다.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이래로 날씨가 항상 맑았는데, 이렇게 흐리고 정신없는 날씨는 또 처음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없는 마을이었다. 투어를 하거나 트래킹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마트가 문을 닫기 전에 음식을 사고 동네를 둘러본 뒤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 작은 교회, 호수를 향해 펼쳐진 들판에서 풀을 뜯는 말들, 멀리 보이는 산들이 전부라고 할 만큼 작은 마을이었다. 세세하기로 소문난 론리플래닛에서도 볼거리에 야외수영장과 교회 정도를 언급했으니까 말 다했지.




수영장은 결코 크거나 세련됐다고 말 할 수 없는, 소박한 곳이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활동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뜨거운 물을 식히는 데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물 밖으로 나와 조금만 걸어도 온 몸에 소름이 돋지만, 뜨뜻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보다 편안할 수는 없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어가는 걸 제외한다면.) 온천이라고 하기에도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도 쑥스러운 곳에서 뜨거운 물에 긴장을 풀고 있으니 나에게 적대적인 것만 같았던 이 마을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는 가지도 않는 수영장을 그 반대편에 와서 찾는다는 게 조금 묘했다.

여행을 하면서 ‘차별’을 당한적은 없다. 하지만 묘하게 거리를 두거나 굳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많다. 수영장의 온탕에 같이 들어가 앉아있는 걸 어색해 한다거나 (덕분에 혼자 탕 하나를 차지하지만 기분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다.) 자리가 다 들어찬 식당에서 알아서 자리를 찾아보다 나갈 때까지 터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다.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때로는 그 결과 내가 편하기도 하니까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나는 별로 이것저것 신경 쓰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의 옆에 자연스럽게(혹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의식하며) 앉으면서 ‘이건 공정하고 공평한 행동이야’ 라고 생각했던 게 떠올랐다. 그 행동은 차이를 인식하는데서 나오는 ‘예절’이었다는 점에서 가벼운 차별일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나 역시 그런 존재일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게 나의 느낌이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고, 만나자 마자 바로 친구가 되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사실이니까.

물인 줄 알고 샀던 탄산수에 맛없는 식빵과 햄으로 샌드위치를 해 먹고 얼른 숙소로 들어왔다. <상실의 시대>를 마저 읽고, 침낭에 파고들어 생각보다 일찍 잠에 들었다.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때로는 하루를 일찍 마감하고 싶은 날도 있으니까.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슬란드 여행기 5 (4) | 2009.12.31 |
|---|---|
| 아이슬란드 여행기 3 (17) | 2009.11.03 |
| 아이슬란드 여행기 2 (28) | 2009.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