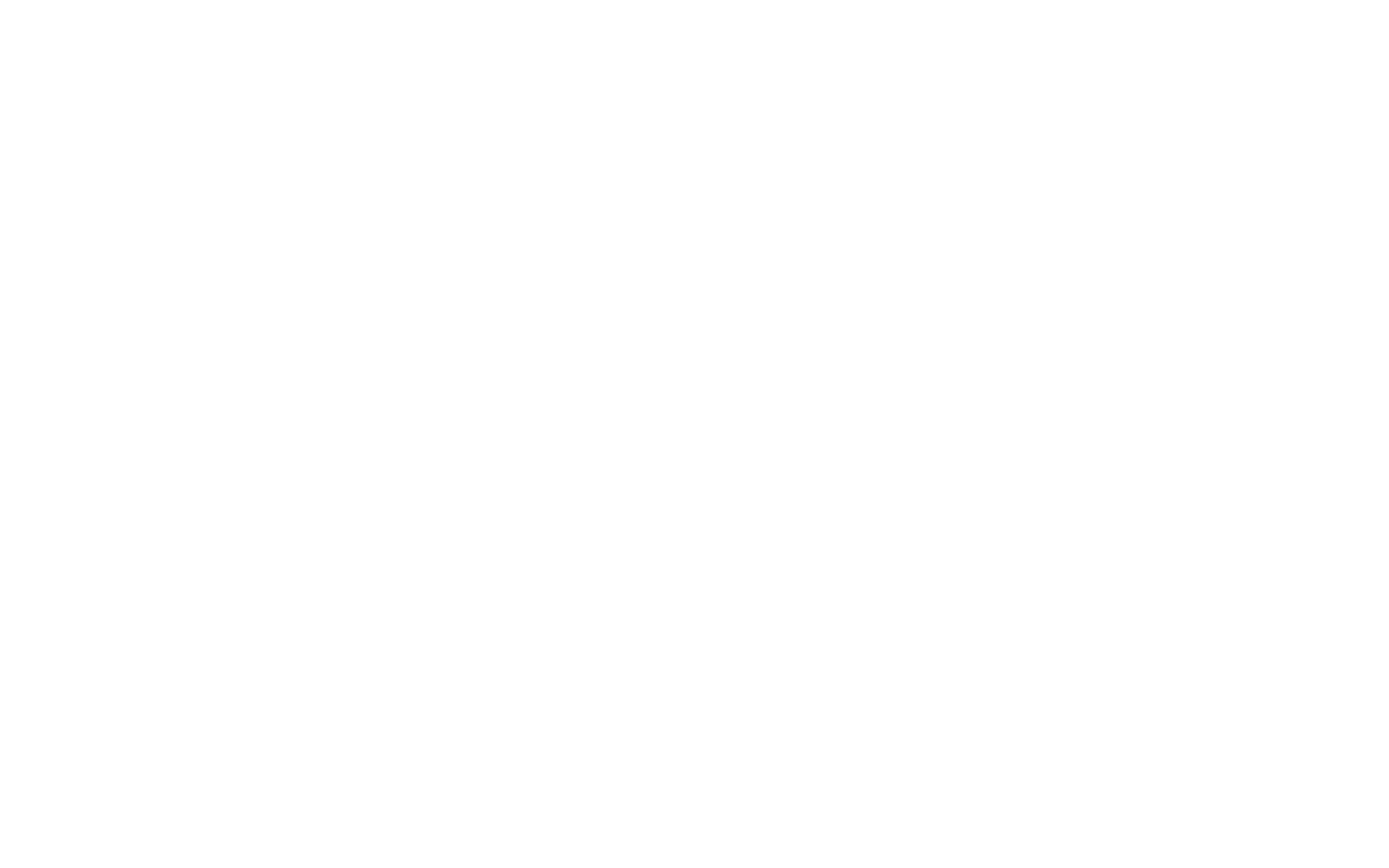야생에 떨어진 것만 같았던 아이슬란드+페로제도 여행을 끝내고 영국으로 들어왔다. 4개월 뒤에 돌아가는 티켓인데다가, 입국심사를 할 때 너무나도 정직하게 1달동안 여행할거다, 다음 여행지는 아직 미정이다 라고 말해버려 내 여행에 대해 한참을 설명한 뒤에야 비가 내리는 어두침침한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레이캬빅(아이슬란드의 수도)이 그동안 봤던 아이슬란드와는 달리 도시라서 번화하고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보다 소란스럽고 관광객 투성이인 런던에 도착하니 아이슬란드의 작은 수도가 얼마나 고요한 도시였나 실감하게 된다. 이런 도시에서 한달이나 머무는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여행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 싶었다.
민박집은 너무 편안했고,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한식을 고려하면 오히려 싼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아주머니도 비수기라 조용하다며 장기할인을 해주겠다고 계속 제안하셨다.) 거기에서 3일동안 지내면서, 이건 너무 편안하고 한국같아서 그냥 '관광'을 온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고 여기에 한달이라는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플랏쉐어를 알아봤고 빅토리아역과 핌리코 역의 중간쯤에 있는 교통도 편리하고 깨끗한 방을 한달간 빌렸다.
런던의 물가는 익히 들어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아이슬란드의 물가를 겪고나니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자취하면서 요리한 적이 없어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점차 나아지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겠거니 싶다. 런던은 정말 많은 스크리닝/전시/공연이 있어 눈이 팽팽 돌아간다. 어제는 '론리플래닛 위킹 인 브리튼'을 들고 빅토리아에서 테이트모던까지 걸어가 전시를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눌러앉아 오후와 저녁나절을 다 보내버렸다.
사우스뱅크 센터의 뒷뜰에서는 슬로우푸드 마켓이 열리고 있고 홀에서는 이번달 중순까지 매일 무료로 공연을 하길래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thomas truax이라는 뮤지션의 공연을 봤다. 그 옆의 극장에선 오시마 나기사 특별전과 sexploitation 특별전, 원닷제로 특별전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영화나 공연값은 거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비싼데, 또 한편으로는 무료 공연과 전시도 널려있다. BFI 극장에선 픽사의 '업' 3D상영과 함께 감독과 제작자의 Q&A가 있는 티켓을 15달러에 파는데(비싸도 봐야겠다 T^T) 동시에 극장 1층의 미디어테크는 전부다 공짜인, 그런 식이다.
주변에 기회는 널려있는데, 또 이 방에서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지만, 패스트푸드의 노예가 되기도 쉽다. 이런식의 자유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두근거리면서도 신난다. 내일은 뭘 할까? 도시를 여행한다는 건 또 이렇게 다르구나.
민박집은 너무 편안했고, 아침저녁으로 나오는 한식을 고려하면 오히려 싼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아주머니도 비수기라 조용하다며 장기할인을 해주겠다고 계속 제안하셨다.) 거기에서 3일동안 지내면서, 이건 너무 편안하고 한국같아서 그냥 '관광'을 온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려고 여기에 한달이라는 시간을 할애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플랏쉐어를 알아봤고 빅토리아역과 핌리코 역의 중간쯤에 있는 교통도 편리하고 깨끗한 방을 한달간 빌렸다.
런던의 물가는 익히 들어서 걱정은 많이 했는데 아이슬란드의 물가를 겪고나니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자취하면서 요리한 적이 없어 시행착오가 많겠지만 점차 나아지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겠거니 싶다. 런던은 정말 많은 스크리닝/전시/공연이 있어 눈이 팽팽 돌아간다. 어제는 '론리플래닛 위킹 인 브리튼'을 들고 빅토리아에서 테이트모던까지 걸어가 전시를 보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눌러앉아 오후와 저녁나절을 다 보내버렸다.
사우스뱅크 센터의 뒷뜰에서는 슬로우푸드 마켓이 열리고 있고 홀에서는 이번달 중순까지 매일 무료로 공연을 하길래 실험적인 음악을 하는 thomas truax이라는 뮤지션의 공연을 봤다. 그 옆의 극장에선 오시마 나기사 특별전과 sexploitation 특별전, 원닷제로 특별전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영화나 공연값은 거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비싼데, 또 한편으로는 무료 공연과 전시도 널려있다. BFI 극장에선 픽사의 '업' 3D상영과 함께 감독과 제작자의 Q&A가 있는 티켓을 15달러에 파는데(비싸도 봐야겠다 T^T) 동시에 극장 1층의 미디어테크는 전부다 공짜인, 그런 식이다.
주변에 기회는 널려있는데, 또 이 방에서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지만, 패스트푸드의 노예가 되기도 쉽다. 이런식의 자유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두근거리면서도 신난다. 내일은 뭘 할까? 도시를 여행한다는 건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날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ake district & Scotland (0) | 2009.10.05 |
|---|---|
| Viðareiði (4) | 2009.09.02 |
| Höfn (12) | 2009.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