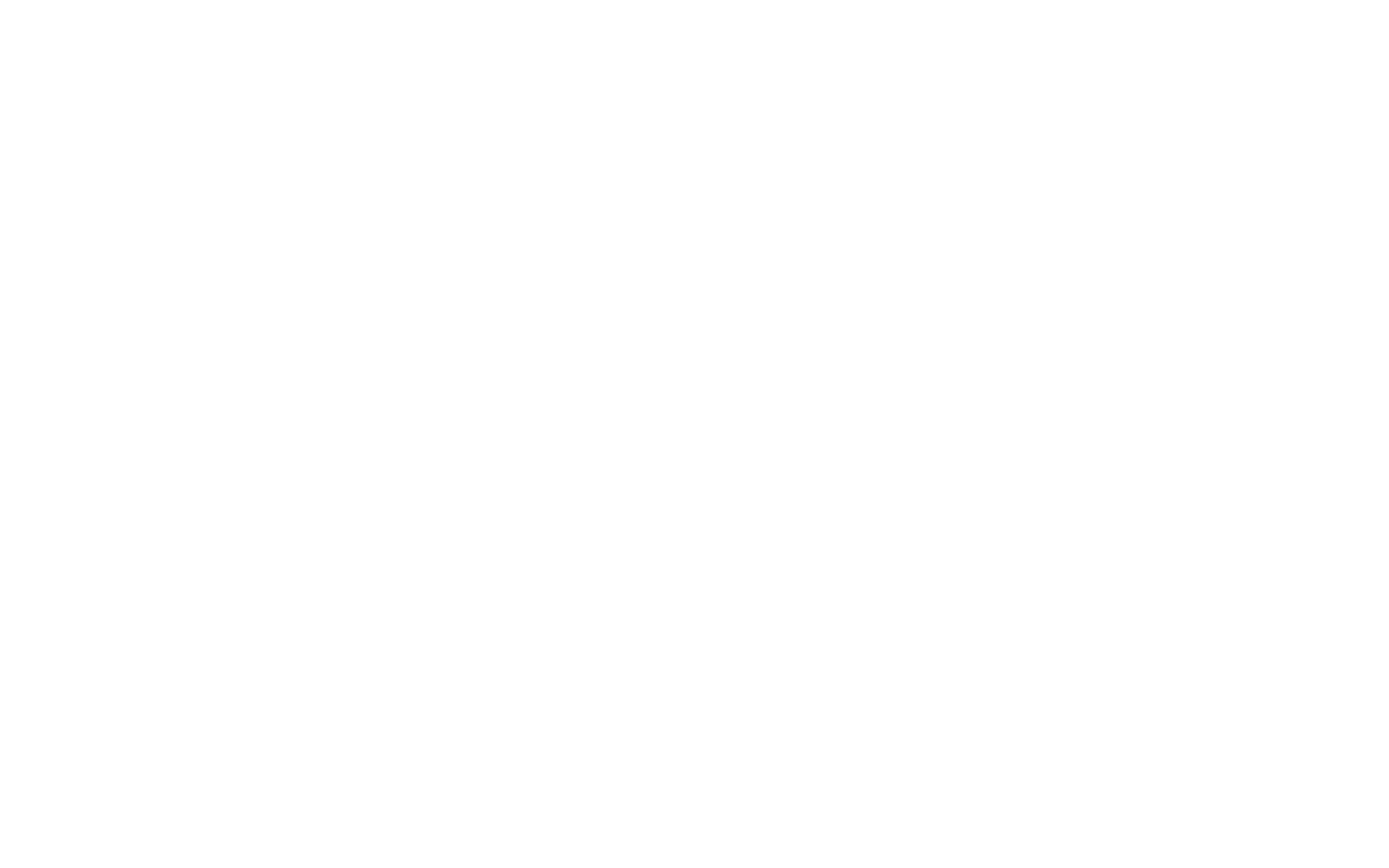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9
로드무비 2010. 8. 20. 15:01 |네셔널 겔러리 1/2
12시쯤 나왔을까? 집 바로 옆에 있는 우체국에 갔다. 아이슬란드와 영국에서 찍은 필름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스무롤이 넘는 필름들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런던에서 현상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주가 넘어서야 발견한 동네 음식점들과 과일가게들... 의외로 바로 옆의 골목을 잘 모르고 살았다. 우체국에서는 정말 친절한 아저씨가, 필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X-ray에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파손되어 빛에 노출될까 소포 앞면 가득 경고 메세지를 적어 국제배송을 했다. 의외로 싼 금액(2만원이 조금 넘었다). 진작에 보내서 일찍 사진을 현상해 받아볼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 하나 해치웠다고 나오는 길에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한 도시에 살면서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은, 빅밴이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곳을 보는 게 아니라, 우편물을 부치거나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리는 피쉬 앤 칩스를 발견하거나 하는 일 들이다.


디자인페스티벌이 열리기 전에, 네셔널 겔러리를 둘러보기로 했다. 무료입장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보자며 여유 있게 방문했는데 이후 4일에 걸쳐 보게 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실은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게 컸다. 매일 점심이 지나서야 나와, 버스 값을 아끼겠다고 한 시간씩 걸어서 네셔널 겔러리에 갔으니까.)
먼저 지하 2층에서는 <Corot to Monet> 전시가 진행 중이었는데, 모네 그림을 기대하고 들어갔지만 다른 작가들의 그림들이 더 눈에 많이 들어왔다. 실제로도 19세기 프랑스의 풍경화를 주제로 잡고 있어서 시원하고 온화한 하늘을 많이 볼 수 있었다. "Sunset in the Rome Campagna" (Simon Denis, about 1800)처럼 하늘이 참 좋았던 그림도 있었고, "Landscape with cumulus clouds, with view of haarlem on the horizon" (Andreas Schelfhout, 1839)나 "The evening star"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830), "Stormy Landscape with Ruins on a Plain" (Georges Michel, after 1830)도 좋았던 작품으로 손꼽았다. 한쪽에 마련된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는,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작품을 몇 배로 확대해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런 깔끔한 작품의 정리가 부러웠다. (이건 다른 유럽의 미술관에도 모두 해당된다. 전시물에 대한 정리와 디지털 열람의 완성도가 높았다. 전시를 통해 전시테마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립한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물론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규모와 디테일을 느끼는 게 제일 좋지만, 기록으로 남겨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 특별전을 제외하고는 일반 상설전시여서 시대별로 관을 따라가면서 전시를 보기로 했다. 일단 13th - to 15th Century paintings 섹션에 갔는데, "The Battle of san romano" (Paolo Uccello, about 1438-40)의 원근법과 관련된 책을 볼 때면 등장하는 그림인데, 그림의 규모와 쓰러진 병정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뭔가 구도상의 오류가 묘한 느낌을 준다 "The Arnolfini Portrait" (Jan van Eyck, 1434)의 그림도 인상적이었다. 아무리 봐도 MB스러운 남자의 얼굴과, 유명한 거울 속 화가 자신의 모습까지도, 빨려 들어가듯 집중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었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림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Venus and Mars" (Sandro Botticelli, about 1485)였는데, 드로잉 노트와 연필을 꺼내 그림을 모사해보기로 했다. 외국에서는 미술관에서 그림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게 자연스러워 보기 좋았기 때문이었다. 나의 드로잉은 형편없지만, 모사를 하다 보면 그림을 더 열심히 보게 된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 내 방에 있던 명화집이 생각났다. 남색의 무거운, A2사이즈는 될 큰 명화집이었는데, 13-17세기의 그림들이 잔뜩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쓰여진 그림에 대한 비밀 같은 기호들. 부모님의 물건이었는데 그것들을 훔쳐보는 느낌에 두근거리며 한 장씩 넘겨봤던, 그런 그림들 혹은 바로 그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부모님이 그런 화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봤다는 것도 신기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사실 이 시기의 그림들은 금방 지루해진다. 종교화가 많았고 작가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살짝 흥미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섹션의 가장 작은 관 중에 하나였던 64번 관에 들어섰을 때, 전혀 인상적이거나 흥미로운 작품이 있는 관은 아니었지만 안내원 아저씨가 눈에 띄었다. 그는 64번 관에 사람이 들어오면 뒷짐을 지고 작품을 지키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들고 있던 작은 노트에 전시된 그림을 모사했다. 지나가는 척 흘깃 봤을 때, 그 드로잉 실력이 상당했다. 매일 수 백 년 전의 그림들을 지키기 위해 방을 돌아다니고, 틈틈이 자신이 지키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멋지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16th Century Paintings 섹션이었다. "The School of Love" (Correggio, about 1525)는 누구나 좋아할만한 사랑스러운 그림이었는데, 나도 그 사랑스러움이 그냥 좋았다. "The amazement of Gods" (Hans von Aachen, 1592-6)의 경우에는 특별히 마음을 끄는 그림도 아니고 좋아하는 그림도 아니긴 하지만, 놀란 순간을 캡쳐한 아폴로의 엄지발가락이 들린 디테일한 묘사들이 와우, 재미있는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엄지발가락의 디테일-
내일은 여행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여행 중에 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한 달이 될 때마다 만찬을 하기로 했다. 여행자에게 최고의 선물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지만 내일은 저녁까지 네셔널 겔러리가 열리는 날이라 전시를 보고 나오면 늦을 것 같아 하루 당겨 오늘 만찬을 하기로 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먹는다는 게 규칙이긴 하지만, 뭐 하루 정도 탄력적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내가 만든 규칙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규칙으로부터도 자유롭고자 하는 게 여행의 목적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Victoria거리부터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깨끗한 분위기의 음식점에 들어가, Bar좌석에 앉아 햄버거를 시켰다. 무려 엑스트라 토핑까지 얹어서. 지출내역 엑셀파일에도 꼼꼼히 적어놓았다. 저녁만찬: 햄버거 8.95파운드 + 토핑2개 0.85X2 파운드 + 콜라 1.75파운드 총 13.95 파운드. 런던에서 먹은 가장 럭셔리한 만찬이었다. 콜라를 홀짝이면서 펭귄문고본 노팅힐 영문판을 읽으며 기다렸다. 나는 크라제 버거에서 먹었던 햄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여기는 정말 최고였다. 절반 정도 먹는데 배가 너무 불렀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쉬움에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먹자.
그런데 음식에서 작은 비닐조각이 나왔다. 웨이트리스를 불러 물어보니, 음식을 새로 가져다 주겠단다.
“아니야 괜찮아 나 배부른걸.”
“아니, 내가 그렇게 해 주고 싶어서 그래. 괜찮을까?”
사람이 아주 친절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음식이 다시 나올 때까지 마시라며 콜라도 공짜로 주었다. 그리곤 거대한 햄버거가 새로 서빙되었다. 친절했던 웨이트리스를 생각해 전투적으로 달려들었지만 내일 아침에 생각나고 뭐고 결국 다 먹지 못한 채 일어났다.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돌이켜보니 자축이라기엔 자폭 같은 만찬이었던 것 같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10 (4) | 2010.08.21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8 (6) | 2010.08.19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7 (16) | 2010.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