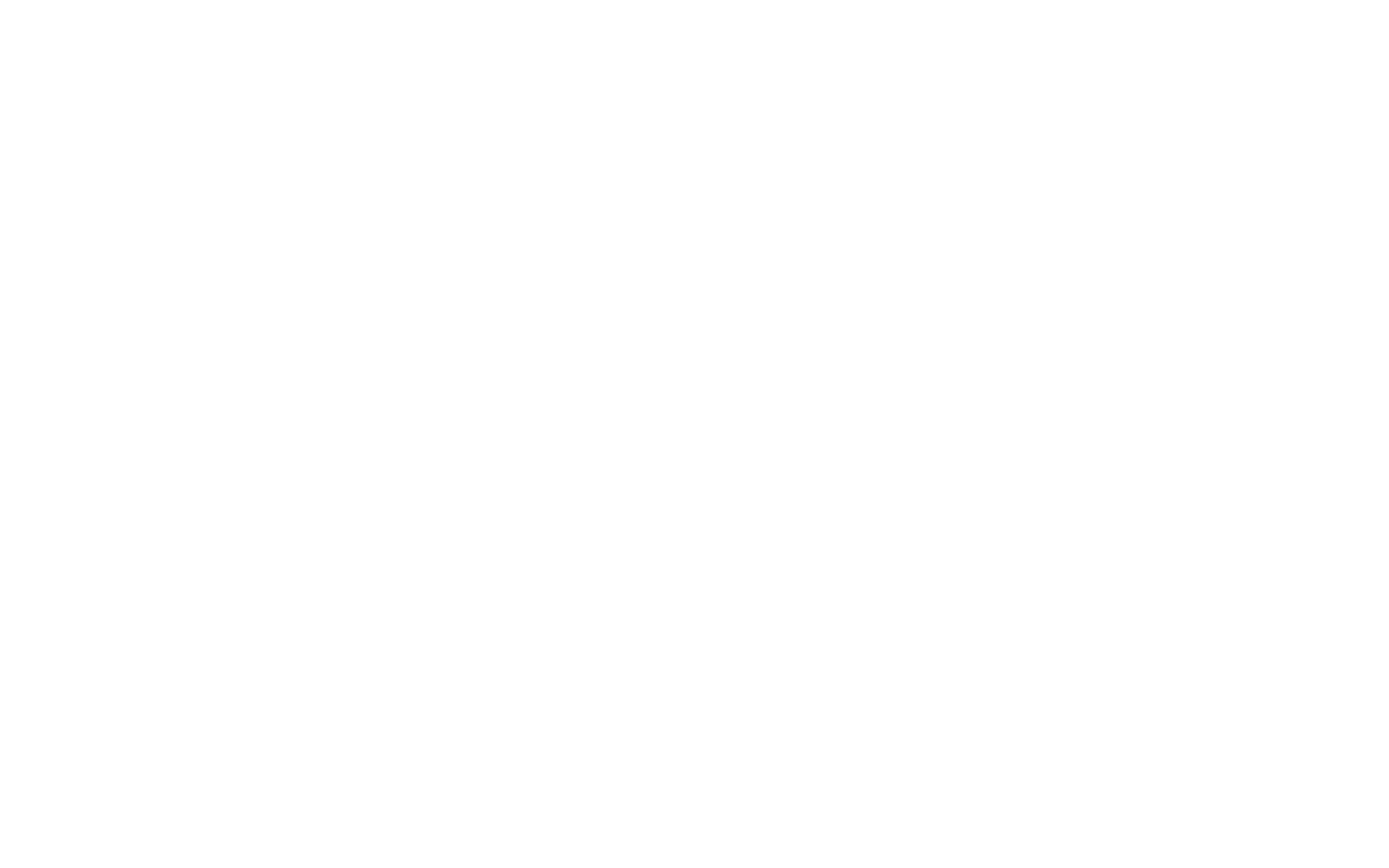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7
로드무비 2010. 8. 16. 15:55 |좋은 전시공간의 조건
오늘은 꽤 일찍 일어나, Sainsbury’s에서 치킨과 콜라를 사 들고 영국박물관으로 갔다. 뮤지엄에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닌데다가 고등학생 때 와본 적이 있었지만 론리플래닛을 읽다 보니 여기는 다시 가 봐야 할 것만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 속성 투어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영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 유적들을 가져왔듯, 나도 나라별로 관들을 묶어 하나씩 정복해나가면서 봤다. 넘버링 순으로 보고 지도에 엑스표를 치면서. 처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관은 재미있게 봤는데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재미가 없어졌다. 오히려 예전에 봤던 것들을 다시 보면서 기억이 날 때의 느낌이 제일 재미있었다. 아 다리가 5개라던 저 조각상이 이란의 것이었구나! 이런 것.
의외로 많은 관들이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의외로 오후 나절 만에 다 볼 수 있었다. 마지막에 일본 관과 중국 관은 생략했다. 유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만 같은 전시가 흥미를 떨어트렸다. 서양인들에게는 뭔가 오리엔탈적이고 뭔가 오묘하게 느껴지겠지만. 대신 박물관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고 많은 중국인을 본 것으로 대체했다. (정말이지 중국인은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


Egyptian sculpture관의 “The Gayer- Anderson cat”의 고상함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지하 Africa관에 있던 “Tree of life”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나무와 동물들을 만들었는데 반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와 닿았다. Themes관의 “Living and Dying”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pharmacopoeia의 “Cradle to Grave”라는 작품(작품 링크) 이었는데, 사람이 평생 먹는 약을 하나씩 퀼트로 엮어 사진과 함께 길게 전시한 것이었다. 어렸을 때는 감기약을 많이 먹고 성인이 되면서 콘돔을 사용하고 비타민제를 먹으며 나이를 먹고… 한 사람의 성장사를 그 사람이 소비한 약들을 통해 반추할 수 있구나.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침략의 결과로 모여 전시된 작품들을 보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콜렉팅 한 것들의 전시만으로 그 곳을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였다. 영국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그리스와 영국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유적인데, 비치된 설명서에서는 애매하게 입장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작품 앞에 선 나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 입장해서 유적들을 보는 것은 곧 약탈로 이루어진 문화재의 독점에 무언의 공감을 표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방에서, 나는 곤혹스러웠다.
두 번째로는 이 박물관이 상당히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사실이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유적들을 그냥 잘 정리해 놓기만 했다. 물론, 콜렉팅과 그것의 전시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괜히 세계 3대 박물관이 아니다. 방대한 규모의 전시실을 돌아다니다가 중간중간 다리가 아파 앉아서 쉬거나 벤치에서 꾸벅꾸벅 자기도 했다-_- (여행 와서 느는 건 뻔뻔함뿐.) 하지만 전시하는 것에 급급해 관객과 소통하거나 감흥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파리 루브르 뮤지엄에서도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선반에 층층이 전시된 것들을 눈으로 보고, 언제 어떤 유물인지 확인하고, 지나가고, 바로 잊어버린다. 한 사람이 소화하지 못할 양의 음식을 계획 없이 한 곳에 쌓아놓아 손님에게 부담을 주는 음식점 같았다.
그러면서 아이슬란드의 “Reykjavík 871±2” 가 생각났다. (관련 포스팅) 영국박물관의 한 개 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박한 유적이었지만 그 유적을 어떻게 소개하고 보여줄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이 있는 공간이었다. 영국박물관이 보여주는 방식의 전시는 ‘옛날의 박물관’이 아닐까. 이제는 이런 올드한 전시 형태 자체가 ‘박물관의 역사’라는 섹션에 ‘박물’되어 전시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새로운 시대의 박물관은 그것이 긁어 모은 소장품의 나열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생각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차례인 것 같다. 오래되다 못해 유머나 센스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박물관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틀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다섯 시간 동안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끝내고, 폐관시간에 맞춰 나올 수 있었다. 전날 블로그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은 런던에서 어딜 가는지 알아보다가 박물관 앞에 한인슈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곳에서 5파운드짜리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다. 한 달 만에 먹는 한국음식인데 맛있긴 하지만 눈물 나게 그리운 향수는 크지 않았다. 라면 두 개와 몽쉘통통 한 박스를 사 들고 해가 지는 저녁에 Soho거리를 걸었다. 화려하고, 비싼 옷 가게를 한참 돌아다닌 끝에 H&M에 들어갔다. 따뜻하게 입을 옷이 필요했는데 영국 남자들의 패션을 보면서 화이트 셔츠에 브이넥 니트를 꼭 입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여행 중에 더러워질 게 뻔한 화이트셔츠는 포기하고, 회색 니트 한 벌을 구입했다. 가격표를 재차 확인하면서, 한국에서도 옷은 사지 않느냐고, 이건 과소비가 아니라고 암시하면서.
전시공간에 대한 이런 불만은 10일 뒤에 ‘Royal Academy of Arts’에서 해소되었다.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기간 중 Central 지역의 거리를 열심히 헤매다 길을 잘 못 들었는데, 영국박물관에 가는 버스에서 광고를 본 ‘Royal Academy of Arts’가 있었다. 들어가보니, Anish Kapoor의 전시가 내일부터 진행된다고 한다.
“저기 사람들은 전시장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맴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개방되는 날이야. 일반관객은 오늘 전시를 볼 수 없어.”
어떤 전시인지는 몰라도 헛발걸음 했다는 사실에 허탈해 돌아 나오는데 안내데스크의 여자가 나를 불러 세운다. 내 뒤에서 안내를 기다리며 대화를 듣던 할머니가 자신이 회원이라며 동행인으로 같이 들어가서 전시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잘 됐네!” 라며 환하게 웃는 여자와 할머니에게 고맙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다. 한국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친절을 여행 중에 만나게 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다. 입장하며 포스터를 보니 무려 12파운드짜리 전시였다. 헉.

http://www.royalacademy.org.uk/exhibitions/anish-kapoor/
들어가자마자 아 현대미술이구나, 싶었다. “As if to celebrate I discovered a mountain blooming with red flowers, 1981”처럼 오브젝트에 붉고 노란 가루들을 뿌려놓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겔러리 바닥 곳곳에 전시되어 있고, (멤버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뭔가 격조 있어 보이시는 어르신들이 낮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며 작품들을 감상하며 거닐고 있었다.
눈길을 잡아 끈 작품은 첫 번째 방 구석에 있었던 “When I am pregnant (1992)”로 벽의 한 구석이 둥글게 나와있는, 마치 벽이 임신을 한 듯한 형상이었다. 놀라운 점은 캔버스라고 할 만한 이음새 없이 전시실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까 벽에서 생겨난듯한 이 작은 혹은, 겔러리의 한쪽 벽 사이즈의 판에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이자 벽) 을 겔러리 벽에 붙인 셈이었다. 엄청난 작업. 안쪽의 방으로 들어가니 “Yellow(1999)”라는 작품이 있었다. 캔버스가 노랗게 칠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 캔버스가 안쪽으로 둥그렇게 패여 있다. 오 마이 갓. 그렇다면 이 설치물 너머에는 얼마나 큰 내부 구조물이 있는 것인가. 구형 홈이 만들어내는 음영의 느낌과, 작품의 거대한 스케일 앞에서 느껴지는 신선한 기분이 좋았다.

반대쪽 방에는 "Shooting into the Corner(2008-9)”의 결과물들이 전시 중이었는데, 겔러리 한쪽 벽을 빨간 물감으로 (말 그대로) ‘쳐 발랐다’. 발사체에 빨간 페인트를 넣어 반대쪽 벽에 ‘발사’한 것들과 동원된 도구들의 전시. “Svayambhu(2007)”역시 겔러리의 여러 방을 할애해 트랙을 타고 물감을 두껍게 바른 벽이 이동하면서 만들어내는 페인팅의 과정을 여과 없이 전시하고 있었다.
Non-objects 시리즈들은 금속의 원형, 기둥들이 곡면을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기묘한 상들을 체험하게 만들었다. 놀이동산 거울의 방에 있을 법하지만 완벽한 finishing과 극대화된 사이즈 앞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과 세계는 기묘하게 왜곡된다. 보통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은 응? 뭐지? 신기하네, 그런데 뭔지 전혀 감이 안 오거나, 아니면 호기심이나 흥미에서 그쳐버린다. 그러나Anish Kapoor의 전시는 작품들을 보면서 감흥과 함께 작가의 의도나 느낌이 분명하게 전해졌다. 익숙한 것의 생경함, 공간의 뒤틀림이 주는 경험들이 좋았다.

의외의 방문이었던 Royal Academy of Arts는 런던에서 방문한 겔러리 중에 테이트 모던과 함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다. 작품을 위해 겔러리를 물감 범벅으로 더럽힐 수 있고, 분리된 공간을 합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여유가 좋았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현대미술 겔러리 자체가 작품을 위해 변형되기 쉬운 공간이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영국박물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작품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8 (6) | 2010.08.19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6 (2) | 2010.08.09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5 (4) | 2010.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