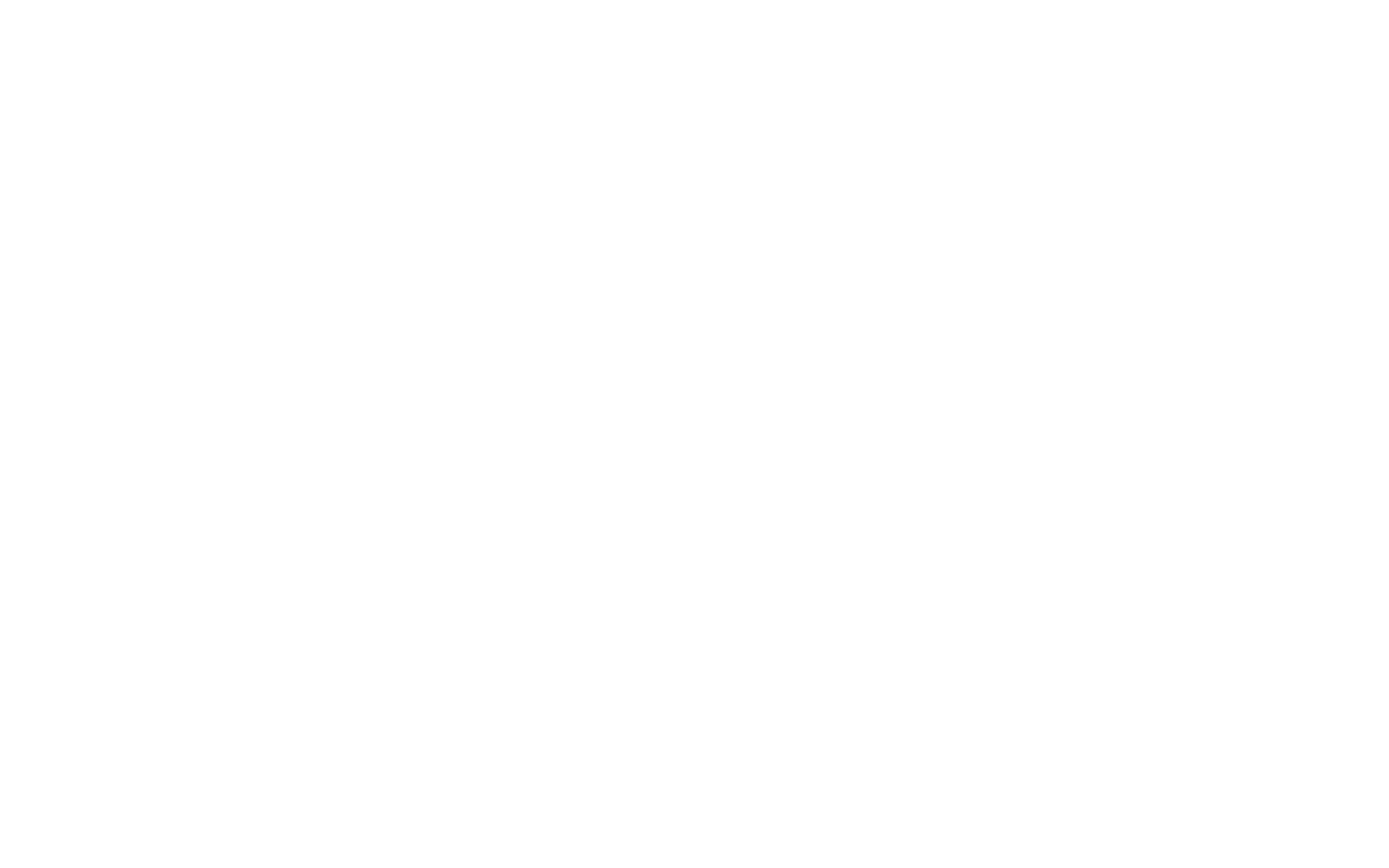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8
로드무비 2010. 8. 19. 12:13 |런던에서 벗어나 걷기 The Kennet & Avon Canal Path
삶이 누적되다가 누적된 일상에 대한 피곤이 폭발하는 순간에 사람은 여행을 떠난다는 말이 있다. 런던에서 나는 여행하기보다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살아서일까? 여행하고 있는 주제에 런던의 일상이 답답해졌다. 매일 10시쯤 일어나 욕조에서 샤워를 하면서 오늘은 뭘 해 먹고 어디에 가서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겨웠던 것이다. 처음 여행을 떠날 때는 런던에서 한 달 동안 머물고 런던부터 스코틀랜드까지 마음에 드는 곳들을 트래킹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트래킹을 다녀온 뒤 깨달았다, 너무 많은 짐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트래킹 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행을 준비할 때 Lonely Planet 책 중에 “Walking in Britain”이라는 영국 내 트래킹을 위한 코스를 안내해놓은 책이 있어 구입해 놨었는데 책을 팔랑팔랑 넘기며 어디를 갈 까 저울질하다가 Bath부터 Bradford-on-Avon까지 걷는 코스를 선택했다. 런던에서 비교적 가까워 당일에 다녀올 수 있고, 코스 난이도도 쉽다고 되어있었다. 책에 적혀있던 이 코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he Kennet & Avon Canal Path
지역 Wessex, 소요시간 4-5hr, 난이도 Easy, 추천시간 Apr-Oct, 교통수단 train
A Flat and easy waterway walk through delightful countryside with a good taste of Britain's early industrial heritage
오래간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배낭을 싸 들고 나서는 긴장감이 좋았다. 집 바로 앞의Victoria 역은 튜브뿐만 아니라 영국의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아주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었지만, 버스터미널이 두 개의 다른 건물로 되어있어 하마타면 버스를 놓칠 뻔 했다.
Bath는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목욕 Bath의 어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역사적인 영향으로 인해 영국답지 않게 로마에 온 듯한 길과 건물들이 낯설었다. 하지만 런던을 벗어난 시골 영국의 매력이라기보다는, 잘 닦여진 테마파크로서의 공간 같았다. Bath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관심 없이 온 데다가, 입구부터 즐비한 쇼핑센터와 관광지 풍경이 그런 인상을 강하게 만들었다. 책에 의하면 4~5시간이 걸리는데, 돌아오는 버스는 이미 예약해 놓았고 Bradford-on-Avon에서 돌아오는 버스도 띄엄띄엄 이라 어서 걷고 싶었다.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잘 걷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소화해 낼 수 있는지 몰랐다. 만약에 늦게 도착해서 버스가 없으면… 모르겠다. 여행자는 운이 나쁜 쪽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는다. 그냥 운이 나쁘지 않기를 바라면서 Go 하는 수 밖에. 성당과 Bath 유적을 의무감에 둘러보고 길을 서둘렀다. 9.5파운드나 했던 Bath 유적은, 봐도 아쉬웠고 보지 않아도 아쉬웠었을 딱 그만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책을 보고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어디쯤 왔는지 체크하며 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운하를 따라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책도 배낭에 넣고 두 팔 휘저으며 걸었다. 햇살이 너무 좋아 집업을 벗고 반팔차림으로 주머니에 넣어놓은 귤을 하나씩 까먹으며, 옆으로 흐르는 운하와 풀들, 나무들 구경하며 한없이 걷고 있으니 오래간만에 내 몸이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운하 옆쪽으로 예쁜 집들도 많았고 조금 더 걸어가니 보트들이 줄지어 정박되어 있거나 운하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보트라는 단어가 적절한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관광용 보트부터 시작해서, 영화에서나 보던 취사와 숙식이 가능한 집으로서의 보트도 있었다. 멋지게 자신의 보트를 페인팅하는 히피도 있고, 한창 요리중인 가족도 있었다이웃과 가족여행을 나온 그룹은 한창 요리 중이었다. 몇 천 파운드면 이 보트를 타고 히피생활을 할 수 있다는 판매보드가 붙은 보트도 있었다. 보트의 주인만큼이나 개성 강한 보트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수공예품으로 전시해놓은 보트도, 강렬한 그래피티로 뒤 덮인 보트도 있었고 심지어 잔디를 지붕에 심어놓은 경우도 있었다.




운하를 따라 계속 걷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이 길에는 어떤 표지도 없는데 혹시 내가 저번 갈림길에서 잘 못 길을 고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 아니야 괜찮을 거야 불안한 생각을 미루고 걷다가도 점점 뉘엇 뉘엇 지는 해를 보면 내가 만들어 낸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자라난다. 불안감이 고조될 즈음 오른쪽에 풀밭과 기찻길이 보인다. 책을 한참 들여다 보니, 그래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길을 걸을 때는 이따금 내 길에 대한 의심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


가끔씩 등장하는 터널과 카페를 지나쳐 한참을 타박타박 걸었다.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푸른 하늘과 운하 옆으로 피어난 풀들, 그리고 흙의 질감을 느끼며 걷고 있다 보니 여기가 한국인지 영국인지 모호해지는 것만 같았다. 너무 비 현실적이어서 아주 현실적인 것들과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
마주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보트나 카약을 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면서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걸었다. 이 길은 평탄하고 운하가 길을 따라 좌로, 우로 바꾸며 한없이 이어져 있어 결코 화려하거나 다채로운 맛은 없었다. 멀리 도로를 따라 세로로 길쭉하게 솟은 나무들이 같은 간격으로 심어져 있고, 그 아래 초원에는 말이나 양 같은 것들이 있고 이쪽에는 운하를 둘러싼 흙 길과 수풀들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따금 산책하고, 마을 동호회 사람들끼리 정기적으로 카약을 타면서 이 공간에 가지는 오래된 애정 같은 것들이 녹아있는 길이었다.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지고 가게들이 보인다 싶더니 곧 Bradford-on-Avon에 도착했다. 도착했다고 기념사진을 찍거나 어디서 도장을 받을 일도 없다. 도착했으니, 여정은 끝났고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 바로 돌아오면 된다. 어딘가 김 빠지는 마무리라는 느낌도 들지만. 정류장에 가니 예정에 없던 버스가 조금 있다가 출발할 거라고 기차를 타지 말고 조금 구경하다가 오란다. 마을입구에 있는 벼룩시장을 둘러보고, 소란스러운 광장으로 옮겨가니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마을 축제가 오늘 여기에서 있나 보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지도에 맞춰 악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유명한 동요인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합창하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았다. 색색으로 꾸며 입은 아이들, 소박하지만 연대 강한 지역 커뮤니티 – 런던에서는 보지 못한 풍경이었다.


운전기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공짜니까 어서 들어가라고 자꾸 손짓을 하길래 이유를 물어보지도 못했다. 뭐, 여행자란 공짜라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다섯 시간 동안 걸어 간 거리를 삼십분도 채 걸리지 않아 Bath로 돌아왔다. 예약한 버스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면서 오래간만에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다. 런던 표지판과 거리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자, 마치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익숙한 서울 풍경을 보고 고향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익숙한 반가움을 느꼈다. 힘을 내서 다시 일상 같은 여행을 해야겠다, 우선 씻고 시원한 콜라 한 잔 하자.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9 (0) | 2010.08.20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7 (16) | 2010.08.16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6 (2) | 2010.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