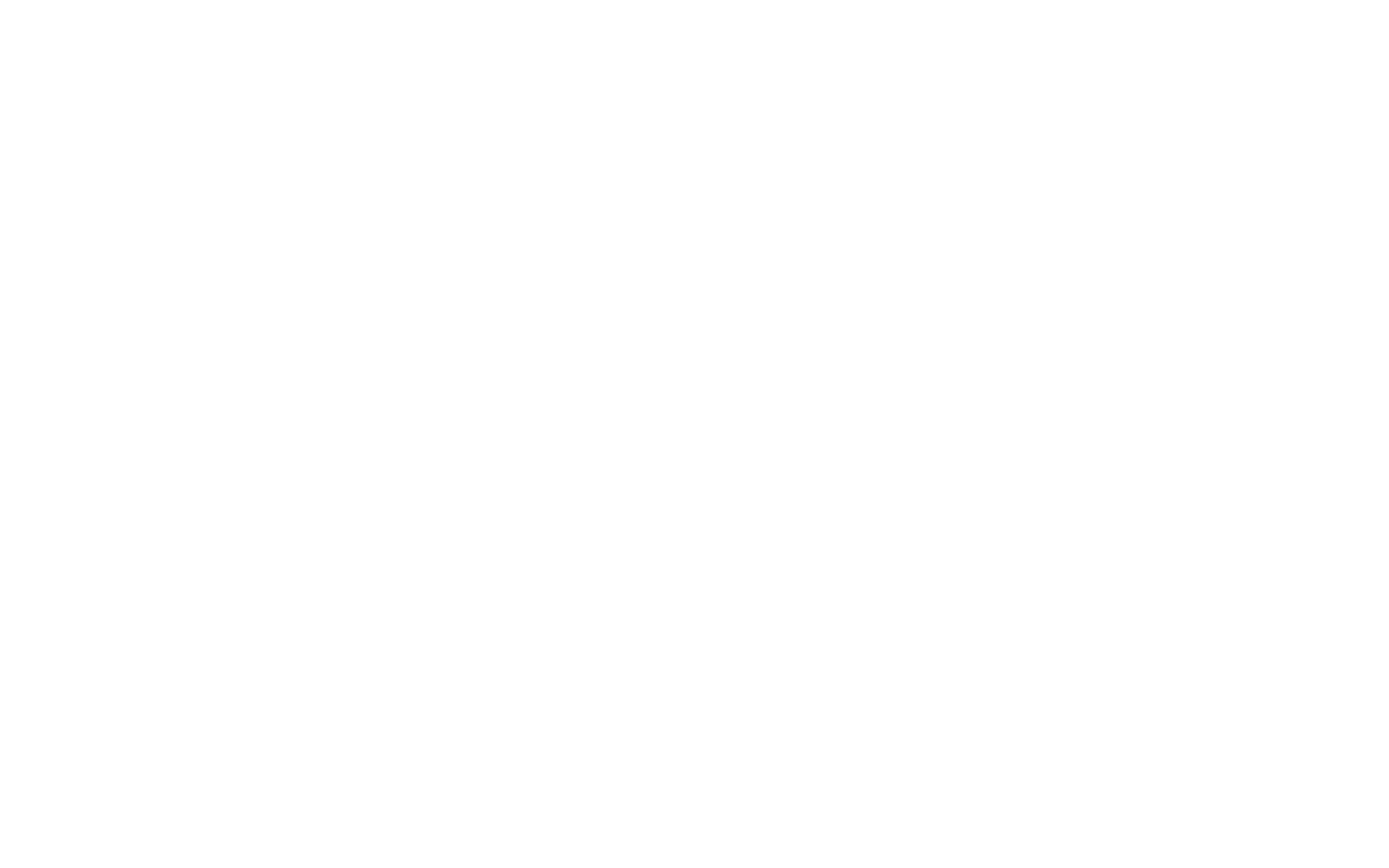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5
로드무비 2010. 8. 8. 01:24 |디자인뮤지엄과 노팅 힐
9월 10일, 오늘은 디자인뮤지엄을 비롯한 런던 동부를 보기로 했다.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미끄덩, 넘어지다가 샤워커튼을 무너트렸다. 물때가 잔뜩 껴서 그걸 다시 천장에 설치하고 나니 진이 다 빠져버렸다. 이제 겨우 아침 열 한신데 녹초. 밥을 해 먹을 마음이 안 들어 빅토리아 역 버거킹에서 1.99짜리 가난한 세트메뉴를 먹고 튜브를 탔다. 튜브는 비싸서 자주 타지는 못했지만, 독특한 재미가 있다. 규모가 작아 가까이 앉은 사람들을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 런던처럼 다인종의 도시라면 더욱더. 오늘도 어디에서 내리면 근처에 있다더라, 라는 얕은 지식에 의존해 한참을 헤맸다. 런던브리지와 시청 건물을 보고 고등학교 때 템즈강 투어에서 들었던 설명들이 다시 떠올랐다. 이쪽의 거리는 모든 것이 현대적으로 세련된 동부와 달리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주는 고전적인 매력이 있다.





특히 디자인뮤지엄을 찾아 헤매는 중에 곳곳에 있는 빈티지숍과 디자인스튜디오들은 그야말로 보물찾기 같았다. 벽과 천장까지 가득한 빈티지 가구들(물론 절반 정도는 썩어가는 쓰레기...)로 가득한 창고형 가구숍은 그 방대한 양과 각종 양식이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였다. 어떤 곳인가 고개를 기웃거리니 들어와서 보라고 나를 환영해준 디자인스튜디오에는 소량 생산한 조명기구들이 가득했다. '저기 누워있는 고양이 빼고는 뭐든 살 수 있어. 마음껏 구경해' 라고 말하곤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는 디자이너의 여유가 부러웠다. 아크릴부터 베개천까지 쓰지 않는 소재가 없을 정도였다. 2년 전 조명기구를 만들던 전공수업이 생각났다.


디자인 박물관은 생각보다 규모가 작았지만 재미있었다. 시대별 디자인 변천사를 벽면 전체에 걸쳐 전시해 놓은 섹션에서는 Contour Chair(David Colwell, 1968)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얇은 아크릴 판에 기다란 메탈봉을 쑥 집어넣어 굳힌듯한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소재의 특성을 살린 변형과정이 드러나는 작품들이 주는 재미가 좋았다. 또한 Sam Hecht + Kim Colin의 Product as landscape의 심플한 제품들도 가지고 싶은 제품들이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런던을 재해석하는 <Super Contemporary>라는 전시 중에 디자이너 Paul Cocksedge 가 내놓은 ‘Rain it in’ 이었다. 전기에 의해 물이 휘어지는 성질을 활용해 전기가 흐르는 Bar를 거리나 지하철에 설치함으로써 비를 피한다는 컨셉이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세면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정전기 놀이하던 경험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참신했다.

( © Artnet)
맨 위층에서는 Javier Mariscal의 드로잉라이프 전이 진행 중이었는데 스페인의 화려한 색감과 선 굵은 일러스트들이 시각적으로 즐거웠다. 특히 영상 디스플레이와 입체로 조립한 종이를 결합한 애니메이션의 상영방식은 인상적이었다.
디자인뮤지엄답게 최근 디자인사이트에서 소개됐거나 유명한 작품들을 1층 숍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이것저것 가져가고 싶은 것들도 많고, 재치 있는 제품들도 많았는데 포기하고, 10파운드짜리 “London Design Guide”를 구입했다. 런던의 구석구석의 디자인 스팟을 정리해놓은 책인데, 사실 지도도 알아보기 어렵고 별로 쓸모가 없었다. 이후 영국여행의 마지막 날까지 이 책을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중고서점을 기웃거렸는데 전혀 소득이 없어 결국 민박에서 만난 한국 분께 선물로 드렸다.


근처 Fashion and Textile Museum에서는 하필 'Undercover'라는 여성의 속옷 전을 하고 있어 아주 민망해 하면서 봤다. 비용에 비해서는 작고 전시도 아쉬움이 많았다.
돌아오는 길에 웨스트민스터 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며 헤드셋을 살 수 있나 알아봤는데, 빅토리아 역 근처의 Argos가 가장 저렴했다. 오가면서 파격적인 offer 광고물이 붙어있는 가게를 봐왔는데 여기 판매 시스템이 또 재미있다. 전화번호부 같은 책이 비치되어 있고 제품을 찾아 코드를 입력하면 재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문을 결정해 결제하면 옆 데스크에서 사람들이 창고에 있는 제품을 찾아 주는 방식이었다. 옛날의 통신판매를 오프라인으로 옮겨놓은 듯한 서비스랄까? 6.99파운드에 헤드셋을 구입할 수 있었다. Sainsbury’s의 피자 반 조각과 샐러드를 해 먹으며 행복해 했지만 곧 바이러스 문제인지 인터넷폰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 헤드셋 값을 날려먹었다는 생각에 좌절했다.
런던 이전의 여행지 – 아이슬란드나 페로제도는 워낙 알려진 정보가 없어 나름 론리 플래닛도 읽으며 준비를 했는데, 런던과 파리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심보로 아무것도 준비해 가질 않았다. 런던에 도착해 방을 구하고 나서야 인터넷을 하면서 ‘런던에 뭐가 재미있을까~’하고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런던의 ‘마켓’을 언급하고 있어서 나도 마켓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빌린 작은 방에 몇 권의 한국어 책과, 요리책(방의 주인인 형은 요리사라고 했다), 그리고 몇 권의 영어책들이 있었다. 주인누나에게 책을 봐도 되냐고 하니 자유롭게 꺼내봐도 괜찮다고 했다. 새삼스럽게 ‘먼 나라 이웃나라 영국 편’을 보기도 하고, ‘손쉬운 한국요리’같은 책도 훑어봤다. 원서 책도 몇 권 있었는데 ‘다빈치 코드’도 있었고 펭귄시리즈에서 나온 얇은 문고판 ‘노팅 힐’도 있었다. 나의 영어실력에 걸맞은 책인 것 같았고 예전에 본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어서 자기 전 몇 페이지씩 읽거나 가방 속에 넣어두고 Southbank Center나 BFI에서 시간을 때울 때 조금씩 읽었다.
그래. 노팅 힐에 가봐야겠다.
여행객인 주제에 주말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마켓마다 정해진 요일에 가장 크게 열린다고 한다. 노팅 힐의 포토벨로 마켓은 토요일이 그 날이라고 해서, 관광객 모드로 무장하고 노팅 힐로 향했다. 빅토리아 역에서 서클라인을 타면 한번에 도착하는데, 튜브가 좀처럼 오지 않아 일단 녹색 노선을 타고 3정거장을 갔다. 알고 보니 공사기간이라 주말은 서클라인을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중에 파리에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12 런던 올림픽을 위해 런던의 구석구석은 공사 중이었다. 이 공사도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머물렀던 9월 내내 빅토리아역 앞의 도로를 비롯해 유난히 많이 공사현장을 본 것 같다.

‘London Design Guide Book’을 따라 근처의 작은 디자인숍들을 볼까 했는데 이 책의 지도가 그리 정확하질 않아 한참 헤매곤 다시 노팅 힐로 돌아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마켓으로 향했다. 컬러풀한 샵들과 파스텔 톤 주택 촌을 넘어 포토벨로 마켓에 도착했는데, 사실 조금 실망했다. 런던 고유의 마켓이라고 하기엔 중국산 기념품들과 무국적 물건들이 노점을 점령하고 있는 게 인사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재미있는 철제 간판들, 레코드, 손으로 그린 영화 스틸들이 여기가 런던의 마켓이라는 걸 증명하는 몇 안 되는 아이템이었다. 흥미가 떨어질 즈음, 큰 길을 건너 기념품 노점이 사라지면서 진짜 노팅 힐 ‘마켓’이 나왔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먹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생선들과 음식을 파는 진짜 마켓! 오래된 필름카메라를 파는 가판대 사진을 찍으니 '오! 그거 Yashica구나!'라고 알아보신다. 옛 카메라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 것처럼 흐뭇하게 웃어주었다. 자금문제로 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간간히 TESCO나 뷰티 상점이 들어와 있는 건 좀 아쉬웠지만 조리법을 짐작하기 어려운 야채들과 저렴한 과일들, 다양한 사람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눈이 즐겁고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난다.


마켓의 끝까지 둘러보고 나서야 아, 영화에 나온 그 “Travel Book Shop”엔 가봐야 되는데, 싶었다. 디자인 가이드북에 표시된 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더듬더듬 찾았더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헌데 영화의 모티브가 된 그 서점(원래 서점과 촬영장소는 다르다. 관련된 정보는 여기에서)이라는 어떤 표시도 광고도 없어, 이 곳이 맞나 싶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영화 속 공간과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구조였고 영화에서처럼 감시카메라가 잡은 서점을 보여주는 TV도 그대로 있었다. 스타일이 멋진 남자 두 명이 서점을 조용히 관리하고 있었고, 서너 명의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었는데, 한쪽 보드에 붙어있는 노팅 힐 영화에 관한 기사 말고는 여기가 영화 속의 ‘그’ 공간이라는 힌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영화가 나온 지 한참이 지나서일까? 설마, 수백 년 전 것도 관광화하는 런던에서.


관광상품으로서의 어떤 때도 묻지 않은 채 영화에서 봤던 그 서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서점이 너무 반가웠다.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는 크네. 어렴풋이 기억나는 영화 속 장면들을 떠올리며 서점을 두리번거렸다. 나 혼자 유난을 떠는 것처럼 서점은 오히려 차분했고 관광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더 고마웠다. 끝까지 유난 떠는 관광객처럼 서점 외관이 인쇄된 엽서를 두 개 사가지고 나왔다.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눈여겨본 스페인 음식 - 해물 볶음밥 (이게 빠에야 라는 건 한참 뒤 스페인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을 5파운드에 구입해서, 낮에 샀던 미지근한 콜라와 함께 길 한복판에 앉아서 먹었다. 여기 사람들은 도로변 옆의 펍이나 음식점에서도 잘도 밖에 나와서 먹는다. 바로 옆에서 차가 매연을 내뿜으며 지나간다. 나도 양쪽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노선의 한 가운데 자전거 주차장에 앉아서, 쏟아지는 햇살을 보면서 밥을 먹었다. 오래간만에 먹는 쌀밥이 너무 좋았다. Sainsbury’s에선 4파운드는 족히 할 청포도를 1.35파운드에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 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튜브를 탈 때마다 들리는 ‘Mind the Gap마인드 더 갭’ 과 지하철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기념품들을 보면서, 1차적 상징물이 아닌 저변에 깔려있는 2차적인 텍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풍부함을 생각해봤다. 런던이 디자인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빅벤이나 런던아이처럼 국가적으로 주목할만한 1차적 상징물들뿐만 아니라 공중전화부스, 지하철표지 같은 도시요소들이 제각기 강렬한 디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관광상품이나 마케팅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2차적인 텍스트를 만들어 낸다. 빨간 글씨로 ‘Mind the Gap’이 프린팅 된 흰 머그잔은 그 자체가 노골적으로 런던을 상품화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런던에서 지하철을 탔던 경험을 떠올리게 만들지 않는가.
집에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픽드라이버를 새로 깔았더니, 바이러스 문제려니 했던 컴퓨터의 모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었다. 인터넷폰으로 3주, 아니 거의 4주 만에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6 (2) | 2010.08.09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4 (4) | 2010.07.16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3 (2) | 201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