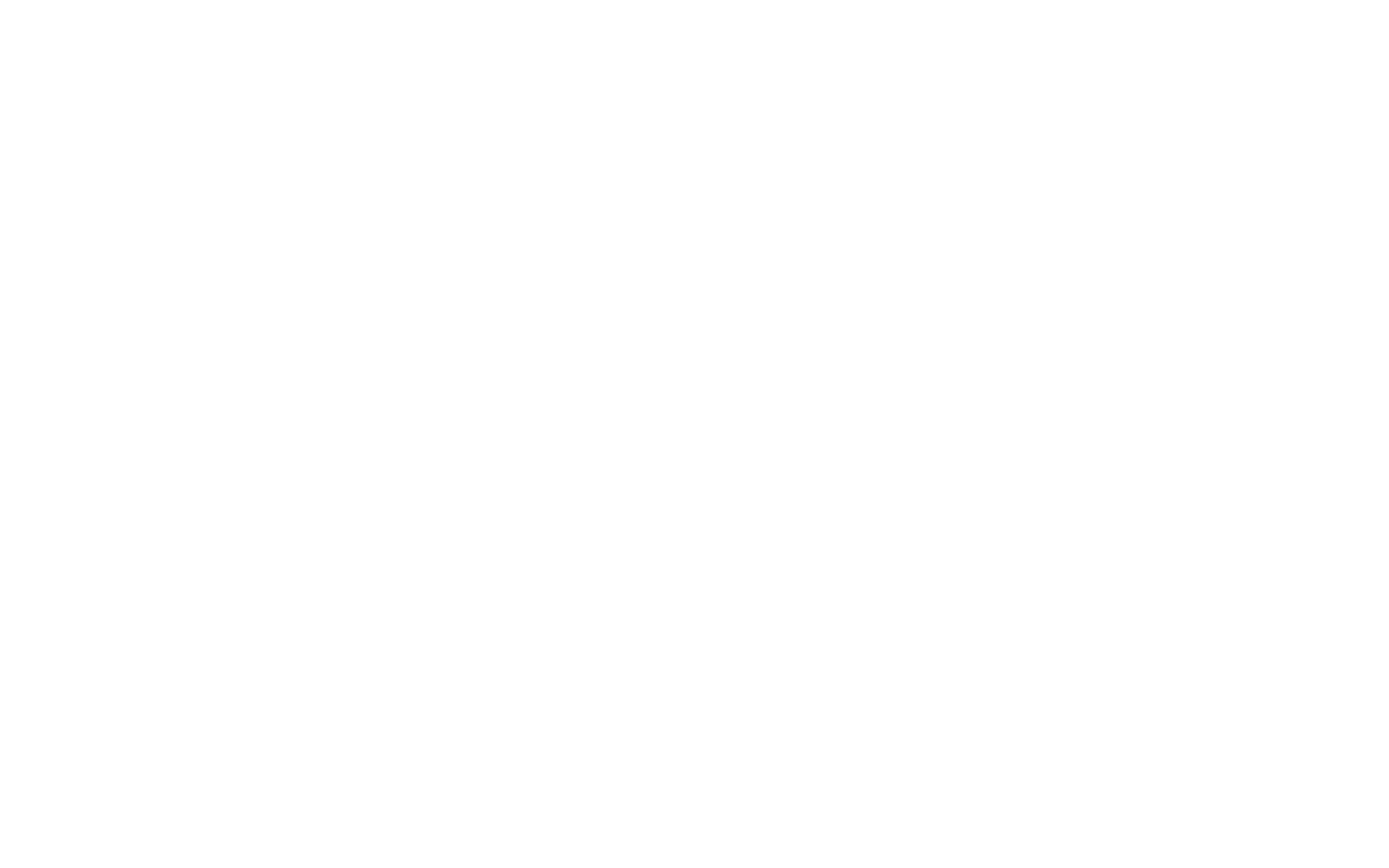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4
로드무비 2010. 7. 16. 15:13 |테이트모던에서 현대미술생각 2/2
5층에서 본 Energy and Process섹션과 States of Flux섹션에는 특별히 마음을 끄는 작품은 없었다. 너무나 컨셉츄얼한 현대미술이라 나에게는 ‘그래서 뭐?’라는 질문 이상을 던지기 어려웠다. 작품이라고 하기에 참으로 모호한 작품들을 하나씩 둘러보면서, 오히려 테이트 모던 콜렉션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작품들이 장기적으로 전시/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럽다고 느꼈다. 아주 재미있었던 두 작품이 있었는데, 하나는 Lucio Fontana의 “Spatial Concept 'waiting'(1960)”이었다. 캔버스가 사선으로 경쾌한 칼질이 되어있는 게 작품의 전부인데 그 어두운 틈 사이로 무언가 있을 것만 같기도 했고, 예전에 학교 미술책에서 본 (혹은 보고 비웃은) 작품을 직접 마주하는 기분도 참 묘했다.

( © Fondazione Lucio Fontana, Milan )
Art&Language (Michael Baldwin, Mel Ramsden)의 “Untitled Painting(1965)”은 캔버스 위에 거울을 잘라 붙여놓은 것이 전부인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감상하려고 서면 내 모습이 보인다. 현실의 반영, 묘사로서의 미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는 작품이기도 했다. 내가 막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려는데 뒤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런던의 갤러리/박물관에서는 사진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헌데 한 관람객이 이 작품이 재미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자신의 모습이 비친 작품을 촬영하려고 했고, 갤러리 직원이 이를 제지했다. “아니, 거울에 비친 나를 찍는 건데 이것도 안되?” “갤러리 내에서 작품을 촬영하는 행동은 금지되어 있어.” “이건 거울이야. 내가 찍는다고 작품이 손상되는 것도 아니잖아.” 둘의 실랑이가 너무 우스웠다. 그 상황 자체가 마치 현대미술에 대한 우화 같았다. 이들도 이 실랑이가 어이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웃으면서 대화를 마무리했다.

( © Art & Language )
사실, 나는 갤러리나 박물관 내에서 사진촬영이 안 된다는 룰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작품을 찍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메모해 두었다가 집에서 찾아보면 고해상도의 좋은 이미지가 많을 텐데. (나도 아주 안 유명한 작품들은 기록해 두고 싶다는 욕망이 들곤 한다. 하지만 모네의 그림을? 고흐의 그림을?) 한 달 뒤에 파리에 도착해서는 작품이나 유적을 –플래시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찍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멈추어 서거나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 정작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다.

( © ARS, NY and DACS, London 2002 )
Ian Dibberts의 “Panorama Dutch Mountain 12X15° sea ⅡA(1971)”은 마치 슈퍼 샘플러 사진을 연상시켰다. 15도씩 카메라의 시선을 돌려가며 찍은 사진들의 조합이 둥근 산 같은 바다를 만들어낸 결과물이 재미있었다.
States of Flux에서는 마지막 작가였던 Ed Ruscha의 “The Music From the Balconies(1984)”의 화려하고 풍부한 색감에 매혹 당했는데 ‘High Rise’라는 J G Ballard의 소설 구절을 활용한 작품이라고 한다. “The Music from the balconies nearby was overlaid by the noise of sporadic acts of violence.” 아이러니한 글귀와 환상적인 하늘. 솔직히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햐, 색이 아름다웠다.

( © Edward Ruscha )
무료로 볼 수 있는 섹션을 다 둘러보니 4시 반쯤이었다. Level4의 유료전시 섹션에서는 미래주의futurism 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6시 마감까지 한 시간 반뿐이었고 level3 전시를 보고서는 소파에서 잠깐 잠을 잤을 정도로 몸이 피곤했다. 미래주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의미 있는 값을 하는 전시일지 의문이 들었지만, 기왕 온 김에 다 봐야겠다고 생각해 큰 맘먹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너무나 좋았다. 우선, 유료전시여서 사람이 아주 적었다. 테이트 모던은 아주 많은 관람객들과 어린이 단체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만큼은 방해 받지 않고 작품을 하나하나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첫 공간에서는 미래주의에 대한 정의와 발전과정이 소개되었는데, 한참 집중해서 읽어나가다가 절반도 이해를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냥 작품으로 뛰어들었다.
Carlo Carra의 “The movement of Moonlight(1910-11)”은 도시 달빛의 모습을 매혹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Umberto Boccion의 “The Laugh(1911)”은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색감만큼은 너무 화려해서 어지러울 정도였고, Gino Severini의 “The Dance of the 'Pan-Pan' at the Monico”는 그 거대한 사이즈와 부드러운 색,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기법이 발길을 붙잡았다.
미래주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탈리아의 전위예술운동으로, 기계문명이 가져온 도시의 약동감과 속도감을 새로운 미로써 표현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잔상으로 남는 역동적인 이미지와 여러 시점에서 본 이미지를 중복시키는 표현기법. 개념설명을 읽는 과정을 포기했기 때문에 커다란 역사적 흐름이나 디테일한 특징들은 놓쳤지만, 시대와 지역별로 나뉘어진 미래주의 그림을 천천히 보는 것 만으로도 미래주의 작품에 대한 느낌이 이해되는 프로그래밍이었다.
Robert Delaunay의 “Effel Tower(1911)”는 사실 내 취향의 색이나 기법은 아니었지만 독특하게 다운된 색감이 시선을 머물게 했고, Liubov Popova라는 러시아 작가의 “Figure + Air + Space(1913)”은 그 제목에 감탄했다. 작품이 주는 무게와 분절된 공간(과 공기)속의 인물이 묘한 매력이 있었다. 바로 옆에 전시된 아름다운 색을 쓴 작품은 좀 더 대중적일지 몰라도, 둘 중에 한 작품을 내 집에 걸어야 한다면 이 작품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미래주의 전시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리고 이 작품 하나로 10파운드가 넘는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건 Luigi Russolo의 “Ricordi di una notte(Memories of a night) 1911, oil on canvas, 100.9x100.9cm, Collection Barbara Slifka” 이었다.

( © Collection Barbara Slifka )
도시의 노란 조명에 웃고 있는 사람들을 옆으로 시선을 아래로 내린 여자의 머리. 위로는 말이 긴 다리를 뿌리 내리고 있었고, 작은 선으로 분절된 왼쪽에 어두운 그림자를 뒤로하고 긴 팔과 다리로 땅을 보며 걷는 남자. 그 뒤에는 한때 즐거웠던 둘의 모습이 빛나고 있었고,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순간의 손들, 잠시 지나쳤던 유혹 같은 여자의 모습들이 있었다.
너무 아름답고 슬프고 우아했다. 그 색감과 소재와 그것들이 주는 풍성한 이야기에 왈칵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두 번, 세 번이나 그 앞에서 작품을 보다 다음 스케줄에 쫓기듯 전시에 나왔다. 숍에서 미래주의 작품들을 엽서로 팔고 있었는데 이 작품은 없었다. 너무 아쉬웠지만, 대중적이지 않지만 나의 베스트로 꼽을 수 있는 작품을 발견했다는 점이 뿌듯하기도 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테이트모던은 아름다운 공간이다. 투박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마저 현대미술의 어떠한 과감함도 포용할 수 있을 것만 같다. 7층의 Bar에서는 템즈강과 밀레니엄 브리지를 포함해 런던의 모습을 보며 쉴 수 있다. (내가 갔을 땐 사람이 엄청 많아 앉을 수가 없었고, 미래주의 전시로 빈털터리가 된 나는 창에 코를 박고 구경하다 내려왔다.) 숍에서는 다양한 미술서적과 전시품을 활용한 문방구, 로고가 박힌 기념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간결하고 실용적인 기념품들을 팔고 있다. 벽을 어떤 정보로 장식했는지, 기부를 위한 설치물이 어떻게 디자인 되어있는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흘끗 보는 것 만으로도 이 곳이 일관된 뜻으로 정리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 지는 것도, 가 볼 수 있는 곳도 아니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5 (4) | 2010.08.08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3 (2) | 2010.07.13 |
| Iceland Film #02 (3) | 201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