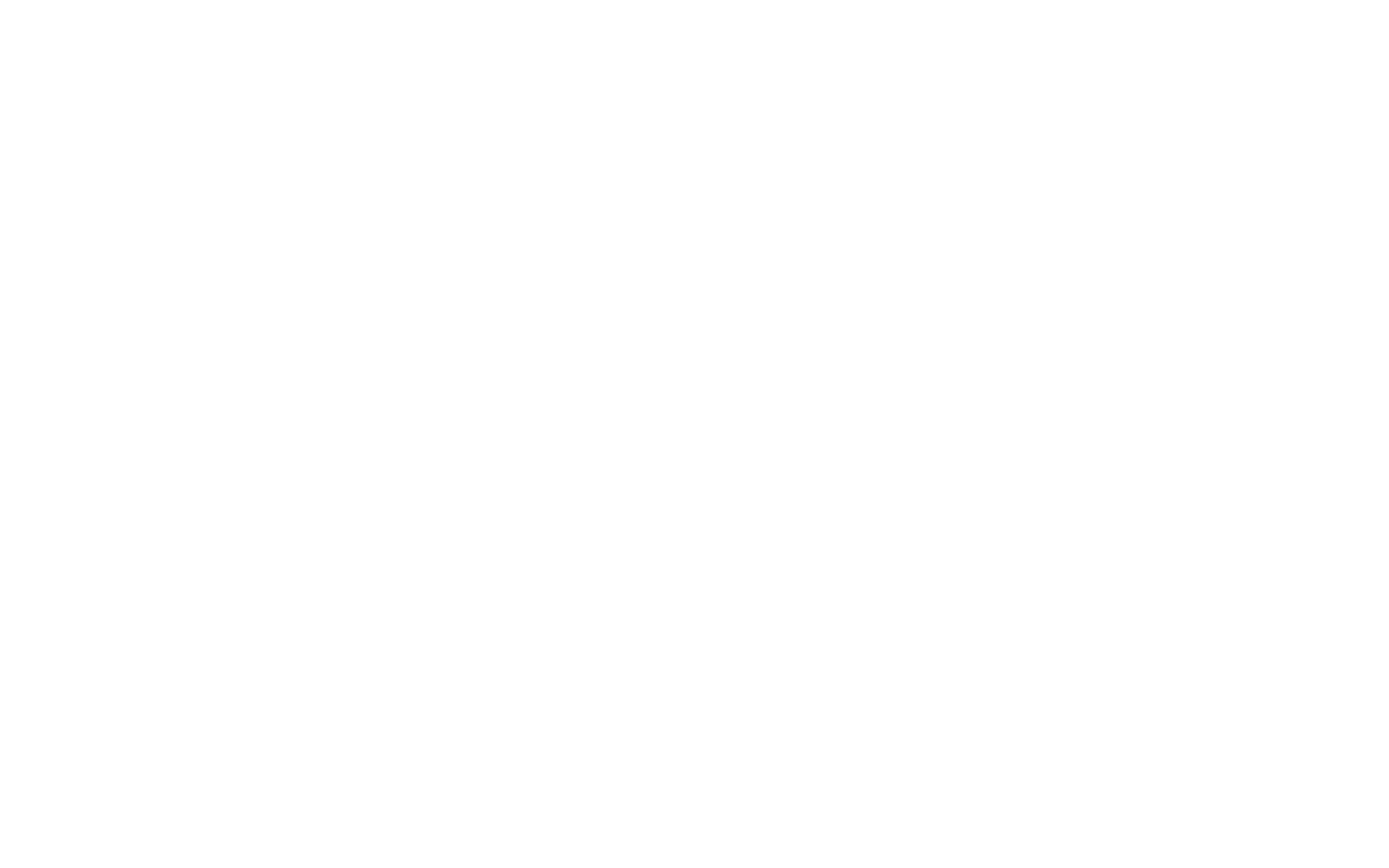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3
로드무비 2010. 7. 13. 16:23 |테이트모던에서 현대미술생각 1/2
런던에서 머물던 날들을 정리해 보니 가장 많이 했던 일은 하루 종일 걸어 갤러리를 찾아가는 일이었다. 정확히 해 두어야겠다. 갤러리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걸어 갤러리에 갔다는 거다. 버스를 타기엔 돈이 아깝고, 한 시간(!) 정도 천천히 걷다 보면 금방(!) 도착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전시를 본다는 건 의외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입구에 도착과 동시에 어디에 앉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다행히 런던의 갤러리들은 대부분 무료입장이라 전투적으로 아침부터 뛰어다니며 눈에 담을 필요 없이, 며칠에 걸쳐 방문하면서 천천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런던이 좋은 이유를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코 '많은 문화활동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일거다.
그 결과, 런던에서 머문 날의 대부분을 갤러리와 디자인페스티벌을 구경하는데 할애했건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가 본 곳은 몇 군데뿐이었다.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다. 이런 호사가 가능한 것도 런던이기 때문이다. (핑계는 좋다)
런던에서 가장 좋았던 갤러리가 몇 군데 있었는데, 단 하나를 꼽자면 역시 테이트모던Tate Modern 이었다. (앞선 여행기에서 썼던) 런던에서 가장 많이 걸었던 길인 빅토리아역에서 국회의사당을 지나 템즈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멀리 테이트모던의 굴뚝이 보인다. 화력발전소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유명한 테이트모던은 서로 다른 두 층으로 입장할 수 있고, 건물의 절반은 천장까지 뚫려있다. 이 거대하고 어두운 건물이 ‘현대미술’이라는 테마로 재정비되었는데, 로고를 비롯해 건물과 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경쾌하면서도 즐겁다.


‘현대미술’의 난해함은 종종 나를 괴롭게 한다. 잡다한 소품의 나열이나 하나의 색으로 페인팅한 그림, 혹은 무제로 이름 붙여진 작품들. 소재와 방식의 파격을 미술적인 감흥으로 받아들이기에 내 눈은 너무 평범하고 무지하다. 그래서 순간적인 흥미 혹은 유머 정도만 남기고 쉽게 잊혀진다. 현대미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아니 좋다 싫다 할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테이트모던에 간 첫날 가볍게 level3 의 Material Gestures를 둘러보니 이 미술관이 나와 같은 일반관객을 위해 배려한 프로그래밍이 느껴졌다. 질감이나 다양한 재로 등 소재가 작품에 독특한 영향을 미친 작품을 모아놓은 Material Gestures는 개별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소재’라는 큰 관점에서 작품들을 보자고 은근하게 제안하는 섹션이었다.
모네Monet의 “Water-Lilies (after 1916)” 와 피카소Picasso, 폴락Pollock까지 여러 거장의 작품들을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어서 좋았다. Kurt Kren, Otto Muehl의 액셔니즘과 과격한 에로시티즘, Marlene Dumas의 누드화 와 Andre Derain의 두터운 붓질과 곰곰이 뜯어보면 파격적인 색으로 채워진 마티스 초상화도 좋았다.

( "Claude Monet, Water-Lilies, after 1916 Photo ©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André Derain, "Henri Matisse (1905) © ADAGP, Paris and DACS, London 2002" )
이 섹션의 압권은 한 방을 가득 메운 Gerhard Richter의 “Cage (1) - (6) (2006)”이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작가. 엄청나게 거대한 사이즈(보통 2.9m x 2.9m)의 캔버스에 오일로 다양한 색들이 마구 얽혀있었다. 흘러내리다 그대로 굳어버린 오일, 여러 번의 덧칠 아래 있는 색들은 가까이에서 그 질감을 느끼며 볼 수 있고, 멀리서 보면 저 오묘한 색이 어떤 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걸까 상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Gerhard Richter의 작업과정을 담은 아트서적을 전시공간 벤치에서 볼 수 있게 놓아 두었는데, 이 책은 작품을 제작하는 중간의 과정들까지 소개하고 있었다.

( "Gerhard Richter, Cage (6) (2006) © 2010 Gerhard Richter - All Rights Reserved
"여기를 클릭하면" 고해상도로 확대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된 작품들도 제작 진행과정을 화집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커다란 캔버스를 세워두고 색을 골라 롤러로 채색을 하고, 시간차이를 두고 여러 번 다양한 색을 덧칠하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짙은 녹색인 작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거친 오일자국과 함께 붉은 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일이 마르기 전에 롤러로 채색할 경우 두 잉크의 색이 혼합되거나, 서로의 궤적을 뭉개면서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꽤나 복잡하고 힘든 작업을 통해 이런 작품이 완성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림을 보는 것은 전혀, 전혀 다른 느낌의 감상이었다.
현대미술을 볼 때 느끼는 두 가지 관점 (너무 쉬운 작품의 경우) “이건 나도 하겠다”, 그리고 (엄청난 노가다 작품의 경우) “고생했군”. 나는 종종 ‘나도 조금 고생 하면 저 정도는 흉내 낼 수 있을 텐데 저걸 아트라고 해야 하나’ 라는 불온한 의심을 한다. 만약 Gerhard Richter의 작품집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의 그림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치자마자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작품의 의도와 제작과정을 오픈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관객이 작품의 의미를 좀 더 끈기 있게 찾아보게 도와준다. 돌아오는 길에, 현대미술 그 자체보다는 현대미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해봤다. 관람객에게 프로그래밍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감상을 돕고, 개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
그 자체로 하나의 현대미술같은 테이트모던의 전시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개별 작품이 좋아서 전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이 탄탄해 전시공간을 좋아하게 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5일 뒤 다시 테이트모던에 갔다. 9시 반쯤 아주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아침을 간단하게 해 먹고 (4일 전에 사온 재료로 4일째 동일한 샌드위치+샐러드) 도착하자마자 지치지 않겠다며 튜브를 타고 테이트모던에 도착한 게 12시 반이었다. (9시 반에 일어났는데도!) Level 3 material Gestures의 맞은편에는 Poetry and Dream라는 이름으로 초현실주의Surrealism에 대한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Forgotten Horizon(1936)”이라는 작품은 섬세하고 흐릿한 게 아름다웠는데 이름표를 보니 Salvador Dali의 작품이었다. 음.. 역시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정말 대중적인(혹은 주입교육적인) 눈을 가진 건가.. 하고 생각했다.

( "Salvador Dalí, Forgotten Horizon (1936) © Salvador Dali, Gala-Salvador Dali Foundation/DACS, London 2002" )
"Meshes of Afternoon" 이라는 초현실주의 단편필름은 Maya Deren, Alexander Hammid의 작품이었는데 상징과 영화적 기교들이 인상적이었다. 어려웠지만 아름다웠다. 예전에 8mm 필름으로 진행했던 실험영화 워크숍이 생각났고 나도 이런 작업들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역시 YouTube는 위대해! 아래 영상을 첨부한다.)
사실 Surrealism은 내 취향은 아니었다. 어렵고 난해하고, 재치는 있어도 미술로서의 매혹은 덜해서. 그래서 전시실 끝에 배치된 리얼리즘작품이었던 Meredith Frampton의 “Portrait of a young woman (1935)”나 “Marguerite Kelsey (1928)”같은 작품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이렇게 섬세하고 실제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니, 같은 원초적인 반응과 감동.
Scale 섹션에서는 재치 있는 현대미술들을 볼 수 있었는데 Robert Therrien의 “No Title(Table and four chairs(2003)”은 그 거대한 사이즈가 주는 생경함이 신선했다. 의자와 테이블 아래를 걷는 느낌이라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걸리버 여행기.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작품이 되는, 현대미술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

( "Robert Therrien, No Title (Table and Four Chairs) (2003) © ARS, NY and DACS, London 2009" )
그리고 이 거대한 작품 사이로 걸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순수하게 질문을 한다. "이 작품을 어떻게 여기로 가지고 들어왔을까. 분해된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했을까? 그렇다면 저 깔끔한 마감과 페인팅의 완벽함은 어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다가 혼자 놀란다. "설.. 설마, 그게 이 작품의 위대한 점? 장인정신?"
아아, 장인정신을 향한 L교수님의 가르침은 휴학을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4 (4) | 2010.07.16 |
|---|---|
| Iceland Film #02 (3) | 2010.05.31 |
| 전주에 다녀와서 (8) | 2010.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