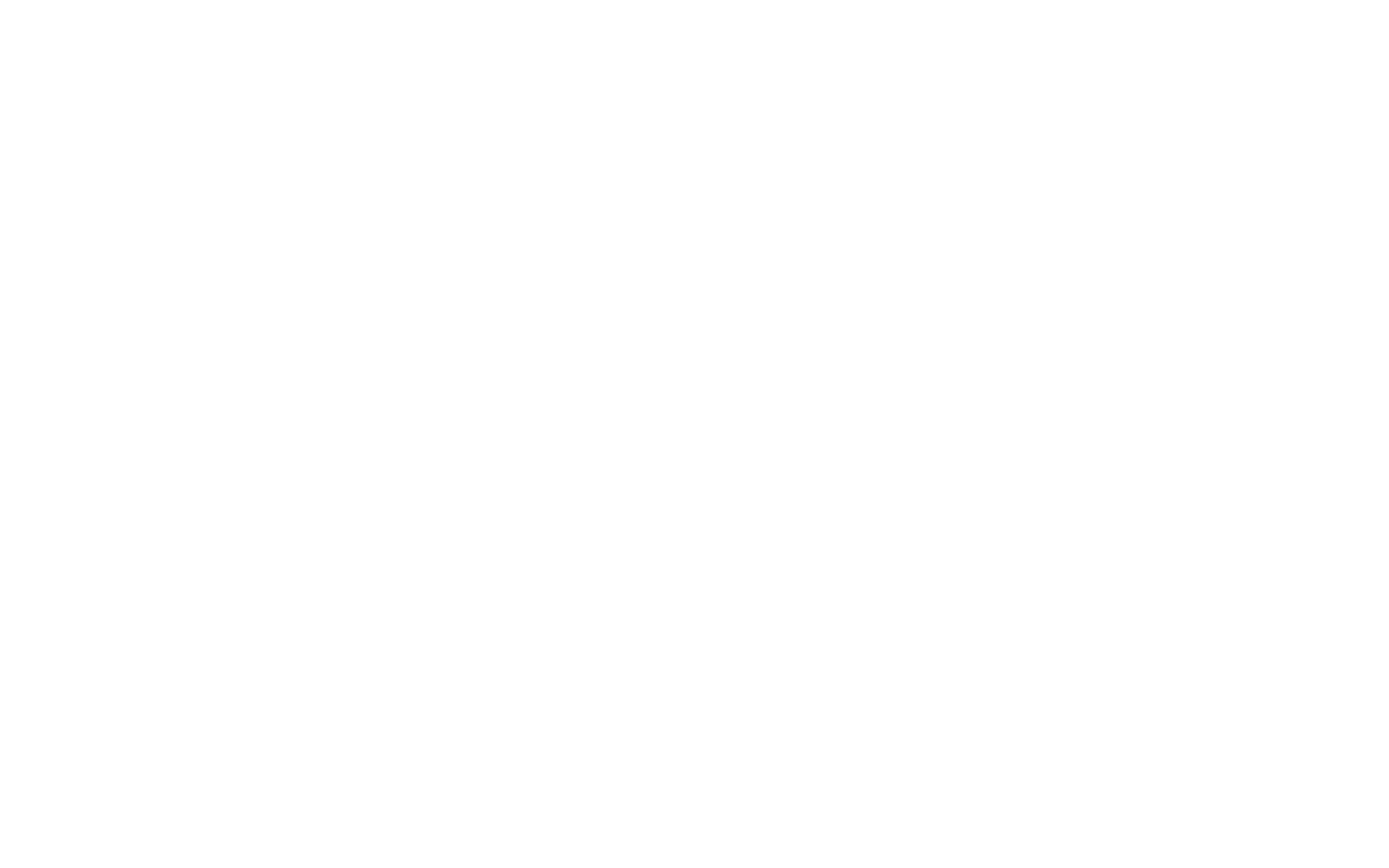우리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맙시다
세 개의 학번 2010. 5. 30. 02:58 |"우리 사람이 되기는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맙시다"
<생활의 발견>, 홍상수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졸작을 진행해 나가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씩 적고 있었는데, 중반 이후부터 글을 쓰는데 시간을 투자 할 겨를이 없어지면서 그때의 감정들이 정리되기도 전에 학기가 끝나버렸다. 김빠지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중간평가는 통과되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을 언젠가 정리해서 써야겠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지나서 쓰는 글이 대부분 그러하듯, 지나가버린 일, 지금의 감정이 아닌 일, 그래서 죽은 시간을 불러내는 일이라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꺼내서 정리하기에 힘들고 잔혹한 시간이기도 하고.
불 같은 크리틱을 받고 심사장을 나왔을 때 극도로 절망적이고 멍해졌다.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가 배반돼서는 아니었다. 한 학기 동안 미적거리며 진행 한 것보다 이삼 일 동안 몰아쳐서 결정하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아이디어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걷어내고 앙상한 실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심사를 받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던 것은 두 장의 판넬과 목업 앞에서 내가 평가 받은 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의 성실함과 능력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방에 돌아오니 스트레스를 풀자며 사 놓은 신발이 도착해 있었다. 작은 사이즈의 신발에 발을 구겨 넣으면서, 신다 보면 발에 맞게 늘어나는 신발이라는 사람들의 평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가 싶었다. 맞지 않는 사이즈에 나를 구겨 넣고 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언젠가 나에게 맞게 바뀌겠지 라면서. K는 그런 비유 좀 그만하라고 했다. 맞아. 난 이런 어설픈 비유 좀 그만둬야 돼. 근데 내가 원래 그래.
졸작을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시작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나를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친구들과 '와, 이런 게 졸전 이구나. 의도했건 아니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야기 했었다. 절반이 지난 지금, 결국 중간평가에서 점검 받은 것은 한 사람의 인간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 졸전 평가가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가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친구들을 언급했다. 이 친구는 참 긍정적이고, 이 친구는 일을 빠르게 해, 이 친구랑 하면 참 즐겁게 잘 되더라. 입도 뻥끗 할 수 없었다. 나도 알고 있다. 디자인을 하면, 일을 하면 나는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고 늘 유쾌하지도 않고 결국 지치게 만드는, 내가 속한 모든 모임과 작업들을 보면 나는 결코 즐거운 동료는 아니다. 일을 잘 하는 것이냐 면 그렇지도 않으면서 날카롭거나 예민하거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기질이 일을 하면 할 수록 더 커진다. 나는 그래서 디자인 일이 싫다. 자꾸 내 안의 괴물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무섭다.
일전에 작업을 하던 중 쌍기역과 쌍시옷이 적힌 문자를 받았다.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나에게 보내려는 문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했다. 나는 명백히 술에 취한 그 사람을 두고 장난이었지,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미안하다, 라고 만 했고 나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스페인 까미노를 미친 듯이 걸으면서, 그 때 그 날 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 것인가. 돌아가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할까. 그 길 위에서 성인이 된 것처럼 고상해지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그런 사람과 나는 약간 다른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체념적인 태도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본다. 사실 별 것 아니라고 넘길 수 있는 것 아닐까. 한참 각종 과제와 디자인 목업들로 괴물이 되어가던 순간의 피로함, 예민함이 야단 떨면서 관계를 절단 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문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너는 지금까지 수 많은 그런 절단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나로 인해 피곤해진 사람들의 관계들이 너저분하게 따라붙었다.
부천영화제에서 한창 쎈 영화들 - 슬래셔, 하드고어, X등급의 영화들을 보다가 어느새 공포와 폭력을 즐기는 내가 무서워서 그런 영화 보기를 그만 둔 적이 있다. 스너프 필름을 재연한 영화를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즐거움을 얻고자 여기에 앉아 있는가, 질문했다. 난도질과 폭력은 점점 무감각해지면서 무섭지 않아진다. 하지만 극장을 나서면서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익숙함과 어떤 쾌감으로 변형되는 걸 느끼는 것이 이런 영화의 진짜 공포였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 뒤로 이런 장르의 영화 보기를 의식적으로 차단했었다.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괴물 같은 모습들이 나의 진짜 모습이고, 어떤 일이든 해 나갈 수록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 함께 있으면 나쁘지 않지만 함께 일을 하면 본성이 드러나는 사람. 지금 나와 즐겁게 지내는 사람들도, 나의 괴물 같은 면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라 내 옆에 있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나를 너무나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내가 막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근본적으로 괴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음학기가 두려운 것은, 더 많은 것들이 파헤쳐지고 나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중간평가에서 통과했다. 하지만 처참하게, 겨우, 형편없이 통과했다. 폐허 속에 흉기 같은 목업을 들고 봄학기가 끝났다.
'세 개의 학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reviously on graduation works (6) | 2010.09.05 |
|---|---|
| K와의 문자 (6) | 2010.04.27 |
| P와의 대화 (0) | 201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