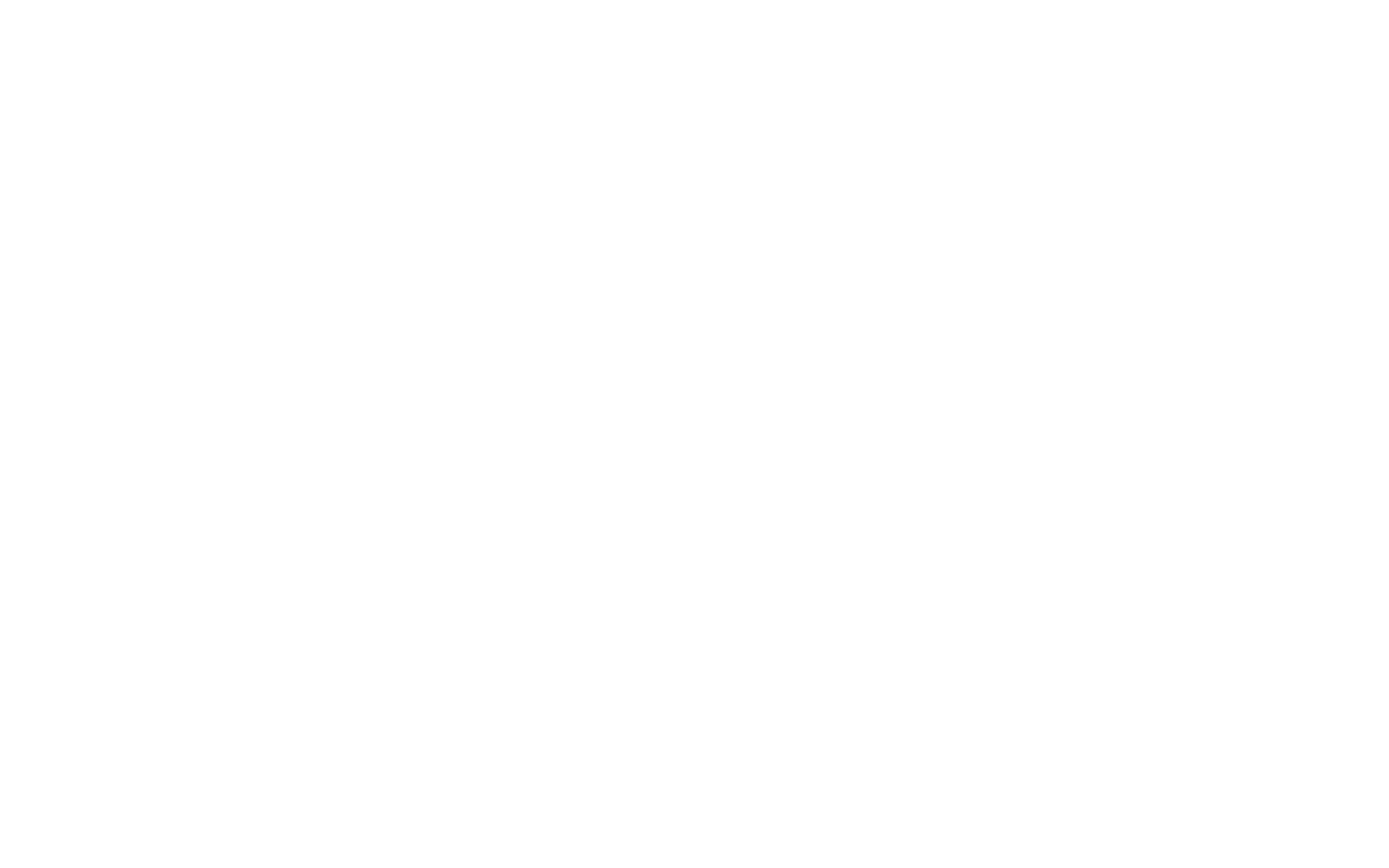3월 26일의 라디오
혼자 하는 라디오 2010. 3. 26. 22:10 |7번국도에서 자전거 타기 1 (7번 국도 中, 김연수)
길은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내 눈앞의 그 길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서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모습을 나는 볼 수 있다. 그렇게 길은 어디로든 통해 있다. 그런 점에서 길은 세상의 어떤 의미에로든 다가갈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다. 서로 참조하고 서로 연결되며 끝없이 넓은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난 가을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풍기는 냄새, 아스팔트에 자전거 바퀴가 끌리는 냄새, 멀리 산에서 유선형으로 불어 내려오는 바람 냄새, 바다였던 때를 아직 기억하는 구름의 냄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곳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냄새들이 서로 뒤섞이고 갈라지고 함께하고 멀어지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스물 몇 해를 보내었다. 별들은 내가 서있는 길의 서편에서 떠올라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사라졌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 나는 낯선 곳에서 잠이 깨었다.
나는 길 위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했었다. 길은 마치 펼쳐진 책의 페이지처럼 내 시선 앞에 펼쳐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다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이 나올 것만 같았다. 한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 세계가 아닌 다른 곳을 염원했었고 그 형벌로 떨어지는 낙석들처럼 다시 길 위로 내팽개쳐졌다. 그렇게 세상에 온 나는 떨어진 밤송이마냥 낯선 길 위에 떨어져 있었다. 이곳은 어디일까? 노래라도 부를까?
내가 배운 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길은 92년 겨울에 산 깊은샘 간(刊) 『길』이라는 김기림의 문집이다. 앞날개는 학생시절의 사진으로 보이는 김기림의 사진이 있다. 짧은 머리에 구부러진 눈썹, 그리고 뭉툭한 콧날과 다부진 입술을 가진 그는 우측 윗부분에서 내리쬐는 인공조명을 받으며 카메라를 쏘아보고 있다. 책을 뒤집어보면 식민지풍으로 차려입은 모습의 김기림이 나온다. 동그란 안경과 뒤로 넘긴 머리칼, 이제 시선은 카메라의 우측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왼쪽 눈이 오른쪽 눈보다 더 크다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의 뒤쪽에는 '김기림을 기억하라!'라는 낙서가 씌어져 있다. 한때 무작정 30년대 작가들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다. 아마도 그때의 일일 것이다.
김기림은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노래한 적이 있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나도 가끔씩 김기림을 흉내내어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라고 혼자 노래부를 때가 있다. 댕겨가는 그것들이 가을 저녁 노을에 찍히는 감나무 가지의 형상을 볼 때처럼 너무나 아쉬워 넋을 놓고 언덕에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 사람은 태어나 끝없이 서로 참조하고 서로 연결되는 길 위를 댕겨가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지구와 달처럼 서로 가까워졌다가 태양계 밖으로 쏘아버린 보이저 호처럼 한없이 멀어지기만 하기도 하는 것이다.
길이 거대한 도서관과 같은 것이라면, 그리하여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과연 나는 이 길 위에 오른 이후에 무엇을 배웠을까? 과연 이 세계의 참된 모습을 열람했을까? 하지만 무엇도 알 수 없다. 나는 끝없이 서로 참조하고 서로 연결되는 길 위에 서 있을 뿐,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수많은 것들, 내가 사랑했던 여자들, 보았던 책들, 들었던 음악들, 먹었던 음식들, 지나갔던 길들은 모두 내 등뒤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아무런 되비침도 없는 유령일 뿐이다. 나의 존재를 되비춰주는 것들은 모두 등뒤에서 머물고 있으니.
한쪽 길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 다른 쪽 길로 접어든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편지가 날아든다.
* 7번국도, 김연수, 34-36p
김연수의 "7번국도"는 오래간만에 보는 호흡이 선명하고 긴 소설이라 천천히 집중하면서 읽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 그 때가 떠올랐다. 울면서 삼십키로를 걸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길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언니네 이발관의 '산들산들'을 들으며 울음으로 쏟아냈다. 나도 그 때 댕겨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 슬퍼 울었던 것 같다.
'혼자 하는 라디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 19일의 라디오 (2) | 2010.04.19 |
|---|---|
| 4월 5일의 라디오 (7) | 2010.04.05 |
| 3월 20일의 라디오 (4) | 201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