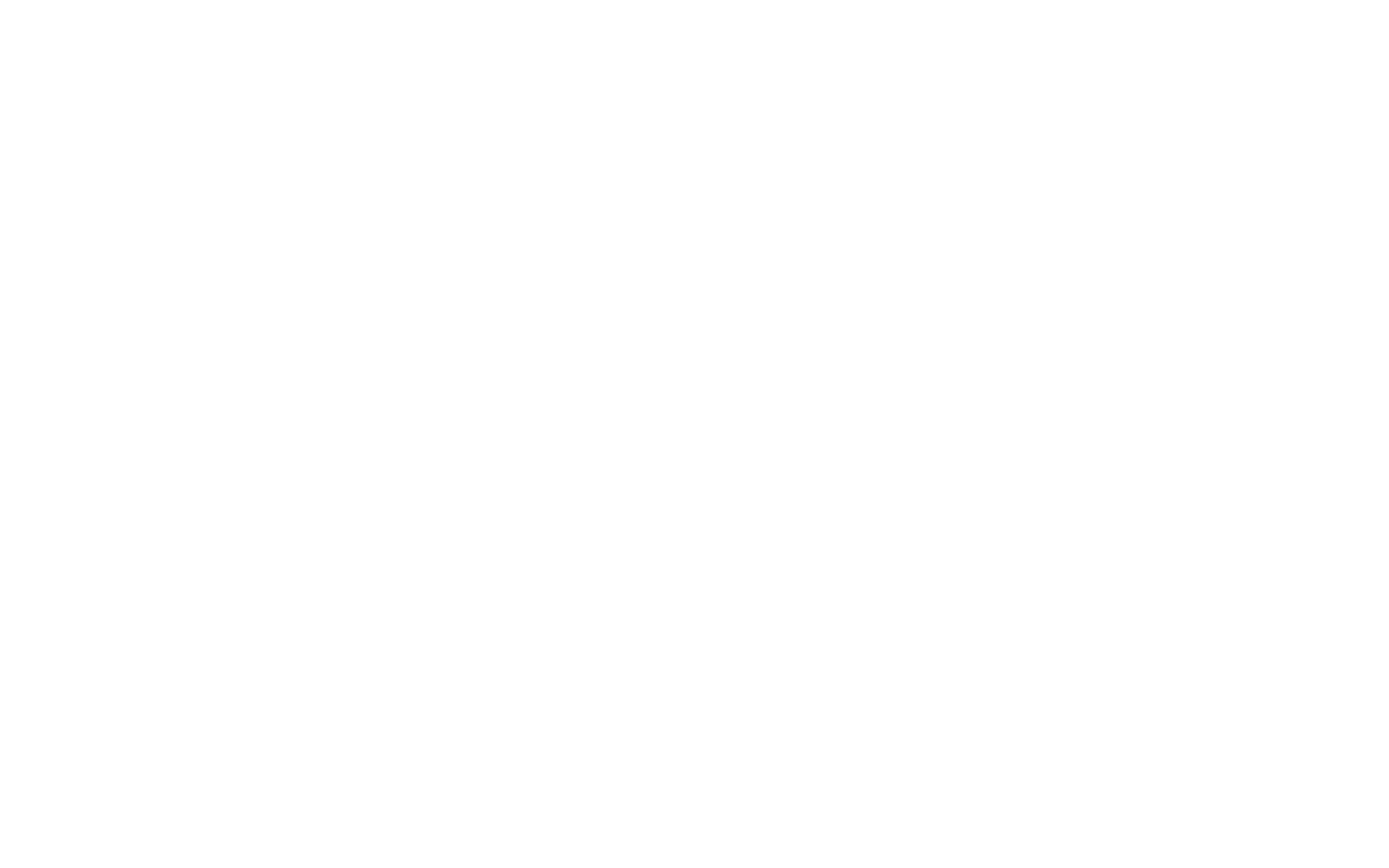아이슬란드 여행기 1
로드무비 2009. 11. 3. 08:05 |# 2009년 8월 20일. 아이슬란드 첫 날
아이슬란드는 입국하는 순간부터 나를 긴장시켰다. 예정보다 30분이나 늦어진 게이트 발표는 저가항공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게이트에 도착해서 발생했다. 샤라포바를 닮은 키 크고 예쁜 누나가 내 여권을 보더니 “비자 없어? 비자 없으면 아이슬란드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응? 아니야. 한국은 아이슬란드 갈 때 비자 필요 없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컴퓨터는 ‘비자 필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계속 비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자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면서 내 여권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응.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있어.” 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비자가 필요한 건가, 내가 잘 못 알고 있었나,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여기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초조하게 데스크에 매달려 있었다. 곧 전화를 끊더니 “그래. 들어가도 좋아.” 란다. 긴장이 탁 풀리면서 너무 기뻐서 손에 키스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까봐 조용히 (그리고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 빠르게) 입장했다.
약 3시간의 비행 끝에 아이슬란드의 땅이 조금씩 보일 때, 옅은 구름 위를 지나는 비행기의 그림자 위로 원형 무지개 고리가 보였다. 비행기가 무지개 고리를 막 통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기분 좋은 시작이었다. 구름 아래로는 부드러운 녹색과 짙은 흑색이 뒤섞여 드넓게 펼쳐져 있고, 가늘고 긴 도로에는 이따금 차 한 대가 지나가곤 했다. Keflavik 공항에 도착해서 겨울옷으로 갈아입고, 아이슬란드 돈을 환전해서 Reykjavik(아이슬란드의 수도)까지 가는 flybus에 몸을 실었다. 시선을 위로 잡아끄는 것 없이, 수평으로 깔리는 땅과 산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평지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다.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BSI 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수도 Reykjavik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터미널에는 여러 버스회사가 passport와 투어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고 그 버스들이 출발하고 도착한다. 아이슬란드는 광활한 자연이 인간의 삶을 압도하고 있어서, 나라 중앙에 있는 산과 빙하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 작은 마을들을 형성하고 있다. 가깝게는 20~30분, 길게는 2~3시간을 차로 가야 다음 마을에 도착할 수 있다. 즉 직접 차를 렌트해서 여행하지 않으면 아이슬란드를 둘러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도 Reykjavik을 출발해서 유명한 지역을 투어하고 돌아오는 버스 프로그램이 잘 발달되어 있다. 나는 그런 투어를 하기보다는 (아이슬란드의 대부분의 자연유적은 모두 무료이다. 하지만 교통비가 비싸서 왕복버스비가 포함되는 투어비는 비싼 편이다.) 더 멀리 작은 곳까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전체를 도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assport를 구입하기로 했다. 작게는 남부를 순환하는 것부터, 아이슬란드 전체와 서부지역까지 도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나는 약 9일정도의 일정을 고려해서 TREX 회사의 Full Circle Highway Passport를 구입했다.
“여기 Reykjavik부터 시작해서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돌 수 있어. 원하는데서 내릴 수 있고 이미 지나친 곳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다시 타서 여행할 수 있어. 만약에 처음에 반시계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그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와야 하고, 다시 역으로 돌아올 수 없어. 즉 처음에 어떤 버스를 타느냐에 따라서 여행 루트가 시계방향이 될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마치 게임 룰 같았다.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버스 시간표를 살펴봤다.
“그럼 지금 3시 반이니까 5시에 12b번 버스를 탈 수 있겠네?”
“응. 5시에 여기 앞에서 버스가 출발할거야. 운전사한테 passport를 보여주면 되.”
한 나라의 수도를 보는 것은 그 나라를 여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건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슬란드라는 미지의 자연, 그 자체였다. 그래서 도착한 첫 날 Reykjavik에 짐을 푸는 걸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다음 여행지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사실, 아이슬란드를 어떻게 여행할지 어디서 내릴지 하나도 정하지 않았다. 첫 날의 숙소도 예약하지 않았으니 할 말 다 했지. 인터넷을 통해서 버스프로그램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여행에 여유를 주고 싶다는 핑계로 현지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게으름이 더 컸다. 남은 시간동안 론리플래닛을 보면서 내가 탈 12번 버스가 서는 마을들을 하나씩 점검해봤다. 전부 아주 작거나 교통상의 거점지 같아서 바로 아이슬란드 남부의 Vik으로 향하기로 했다. 인구 29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숙소도 제법 있었고 (그래봤자 호텔을 포함해 6개 정도가 전부지만 이정도면 다른 마을에 비해 정말 많은 편이다.) 작가의 Favourite Trip으로 꼽은 지역이었다.
버스를 타기까지 남은 시간동안 숙소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8월 중순-말은 아이슬란드 여름 여행의 마지막 피크인 시기인데다가 버스가 Vik에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 8시 반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렴한 유스호스텔부터 전화를 걸었는데 ‘미안해 오늘은 꽉 차서 자리가 없어’ 라는 답변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곳 뿐이었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Vik으로 가도 되는 걸까? 버스터미널에서 추위에 떨면서 자야하는 걸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이슬란드는 Reykjavik과 몇몇 큰 마을을 제외하고는 따로 터미널이라고 할 만한 공간이 없다. 그냥 주유소나 마을 입구에 멈추어 선다. 한마디로, 어디 노숙할만한 곳이 없다!) 그렇다고 여행을 주저할 수는 없는 법. 내 몸뚱아리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배낭을 메고, 아무튼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버스에 짐을 실으면서 운전기사한테 물어봤다,
“나 근데 아직 어디서 내릴지 못 정했어. Vik에 전화해봤더니 유스호스텔도 게스트하우스도 다 꽉 찼대서. Vik이랑 Hvolsvöllur 중에 어디가 방 잡기 더 쉬울까?”
아저씨는 고민하더니 옆의 운전기사를 불러 아이슬란드어로 뭐라고 대화한다. 지켜보던 터미널의 직원 아줌마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니 “호텔은 어때?”라고 묻는다.
“안되. 나 돈 없어... 가난해. 게스트하우스나 유스호스텔 정도여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몇 마디 주고받더니 “일단 Vik으로 가봐! 거기가 더 구하기 쉬울 거야.” 란다.
뭐, 별 수 있는가. Vik으로 가는 수밖에.


버스에서는 처음 보는 아이슬란드의 생경한 풍경에 흠뻑 빠져 사진도 찍고 캠코더로 촬영도 했다. 울퉁불퉁한 돌멩이에 얕은 풀들이 근경에 있다면 부드럽게 경사진 초원에 양들이 방목되어 있고 그 위로는 낮은 채도의 암석이 가파른 경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의 푸른 하늘. 압도적인 풍경인데 그게 평화롭게 다가온다.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두 감정의 풍경에 감탄했다. 수도를 벗어나면서 거의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다. 개천을 건너는 다리는 대부분 차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너비였는데, 먼저 온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다음차량이 지나가는 식이었다. 자연스럽게,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멋지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왼쪽에 폭포를 두고 지나가나 싶더니 샛길로 빠져나와 방향을 바꾼다. 알고 보니 운전기사 옆쪽에 앉았던 커플이 기사를 졸라 폭포를 보고가지고 했나보다. 5분간 쉰다는 말에 카메라를 들고 폭포 쪽으로 뛰어갔다. 어렸을 때 가족휴가로 우리나라의 몇몇 산들을 가봤는데 거기에서 볼 수 있었던 정갈한 느낌이 아닌, 시원하게 압도적인 폭포의 모습이 낯설었다. 나중에 유명하고 굵직한 폭포들을 보면서, 이 폭포는 아주 작아 이름도 없는 폭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그만큼 크고 많은 폭포들이 있다. 섬 중앙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 폭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얼굴을 적시는 작은 물방울의 청량감을 느끼며, 새삼스럽게 내가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터미널 어디서든 잘 수 있겠지,라는 무모한 자신감으로 출발했지만 아이슬란드의 마을은 말 그대로 ‘마을’ 이어서 집 수십 채와 목초지가 전부라는 걸 보게 된 뒤로는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싶어졌다.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질수록 숙소의 데스크가 문을 닫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긴장감이 커진다. 해가 완전히 넘어 갈 즈음, 버스는 작은 불빛들이 모여 있는 해안가의 마을에 도착했다. 버스의 종착지가 Vik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선 버스가 갑자기 멈추더니, 운전기사가 나에게 와서는 내리란다.
“응? 이 버스 Vik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나 Vik에 갈꺼야.”
그런데도 운전기사는 뭐라고 말하더니 먼저 내려서 내 짐을 내리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건 무슨 상황이지? 얼른 버스에서 내렸다.
“너 숙소 찾고 있었잖아? 여기가 게스트하우스야. 저기로 가면 되.”
아저씨는 내가 숙소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Vik 외각의 종착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나를 내려주려고 했던 것이다. 정신없이 배낭을 메고 고맙다고 인사한 뒤 'Gistihús Ársalir'라는 간판의 게스트하우스로 달려갔다. Reykjavik에서 전화를 걸었을 때 받지 않았던 곳이었다.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방을 안내해주겠단다.
“어.. 그럼 방 있어?”
“물론이지. 저쪽 방 쓰면 되.”
태연하게 방을 안내해주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긴장이 탁 풀려 헛웃음이 나왔다.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러 여행을 왔다는 벨기에 사람들과 인사한 뒤, 도미토리 침대에 짐을 풀었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 금방 9시가 되어 어두워졌다. 나는 Lonely Planet에서 추천한 Halldórskaffi 펍에 들어가 큰 맘 먹고 피자와 바이킹 맥주를 시켰다. 한국의 반대편에 있는 섬에서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국어를 쓰는 술집에 앉아 피자와 맥주를 먹고 가져갔던 <상실의 시대>를 조금 읽었다. 유럽까지 여행을 가면서 왜 <상실의 시대> 같은 책을 가져가느냐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여행에 어떤 책들을 가져갈까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문득 ‘<상실의 시대>는?’ 이라고 물어봤다.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여행 전 날 짐을 싸면서 만약 책을 가져가야 한다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으면서도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가장 가까웠던 이 책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다.
아이슬란드 남부의 작은 마을 술집에서 바이킹 맥주를 마시며 몇 년 만에 책을 다시 꺼내 읽는 느낌이 묘했다. 처음 책을 읽고 그 뒤에 몇 번이고 반복해 읽은 뒤로는 한참을 보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는 우리 집에 새 책이 도착하면 어김없이 그 첫 장에 누나와 내 이름, 그리고 책이 도착한 날의 날짜를 적었는데, 이 책은 2000년 11월 7일에 우리 집에 왔다. 계산해보니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다. 누나와 내가 조숙했고, 책 읽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중학교 1학년인 아이에게 이 책을 사준 걸까? (아마 어떤 책인지 모르고 사 주셨으리라. 그 당시에 이 책이 붐이었었고, 부모님은 책을 사는 거라면 전혀 아깝지 않다며 원하는 책들은 다 사주시곤 했다.) 오래간만에 다시 <상실의 시대>를 읽으면서 나의 많은 생각과 행동들이 이 책에서 발췌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에 고마움이 더 크지만, 아무래도 내 자식에게는 중학생 때 이 책을 읽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한조각의 피자를 끝내 먹지 못하고, 책의 1 장을 다 읽고, 어두운 마을을 걸어 올라와 침대에 몸을 뉘었다.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이슬란드 여행기 2 (28) | 2009.11.03 |
|---|---|
| 아이슬란드 여행기 (0) | 2009.10.07 |
| 여행 준비 : 어디로 (12) | 2009.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