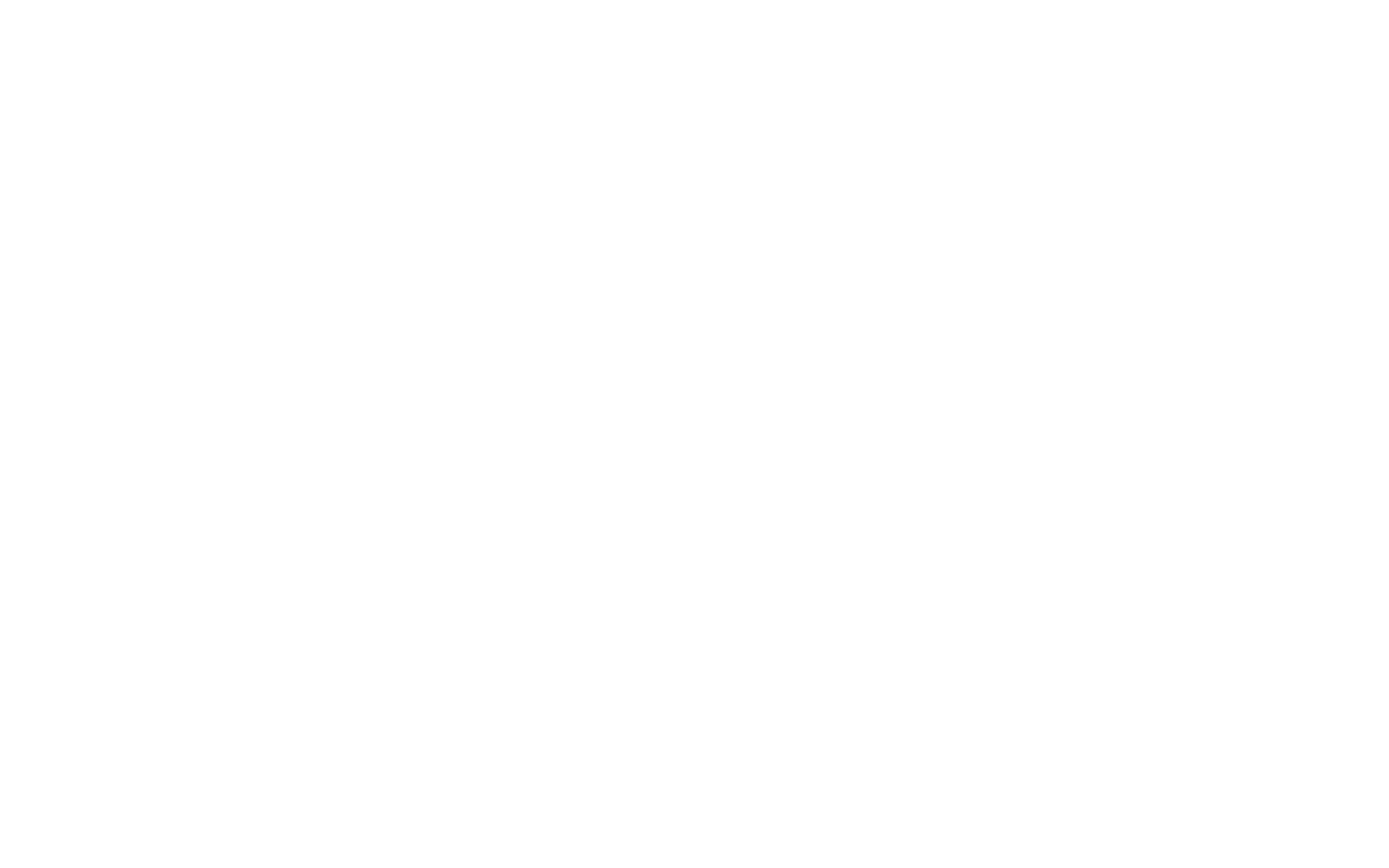감추어진 것들이 만들어내는 영향
그날의 생각 2013. 7. 10. 04:35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내 삶이 그 정도로 예민하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런 스테레오타입 - 아, 이런 표현이 그 친구들을 정신적 기작의 원인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는데 - 에 내가 속하리라는 순진한 기대도 이제는 없다.
3년간 3명의 친구를 보내놓고도 나는 그들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얼마전에 다시 떠올랐다. 당시엔 삶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그런 정보들, 혹은 감정들로부터 차단되도록 잘 관리받았는데 그래서 놀랍도록 빠르게 그늘에서 벗어났다. 혹은, 어쩌면, 남아있는 우리들의 우정이라는게 그 그림자의 영향 안에 있기에 그나마 이렇게 끈끈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본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친구들의 기일도 곧잘 잊어버리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다만 제 때 풀어내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본다. 그것은 선택의 원인이라는 정보가 될 수도, 관계의 결말에서 풀어냈어야 했던 감정일 수도 있겠다. 그것이 나와 전혀 관계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것을 알아야만, 그래서 그에 대한 미안함이나 무지함(혹은 무지함에서 오는 미안함)을 해소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나에게 가위바위보를 제안한다. 나는 보자기를 냈는데, 친구는 등 뒤에서 손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음날부터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친구가 등 뒤에서 가위를 냈는지, 바위를 냈는지, 보자기를 냈는지와 그 친구가 내 삶에서 사라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문제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증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취한 마지막 제스쳐의 해답이 필요하다. 그걸 알기 전까지 나는 내가 낸 가위와 그가 선택한 가위바위보의 답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친밀한 사람들을 만날 때 - 이를테면 대학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랩에서 회식을 할 때 - 나는 종종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몇 개월, 몇 년 후에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바로 내 앞에서 실없는 이야기에 웃고 떠드는 사람중에 누군가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혹은 등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들의 얼굴이 기묘하게 세밀해진다. 이런 생각들도 감추어진 것들이 만들어낸 영향일까?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절대 그들을 찾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내가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일 것이라는, 결정적인 무엇이 되지도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혹시 감추어진 것들을 감춘 것이 나인가?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나와 관계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불을 질러버렸나?
'그날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글씨 (0) | 2013.08.22 |
|---|---|
| 다시 글 쓰기를 생각하면서 (0) | 2013.06.05 |
| 박사 첫학기 개강 전날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