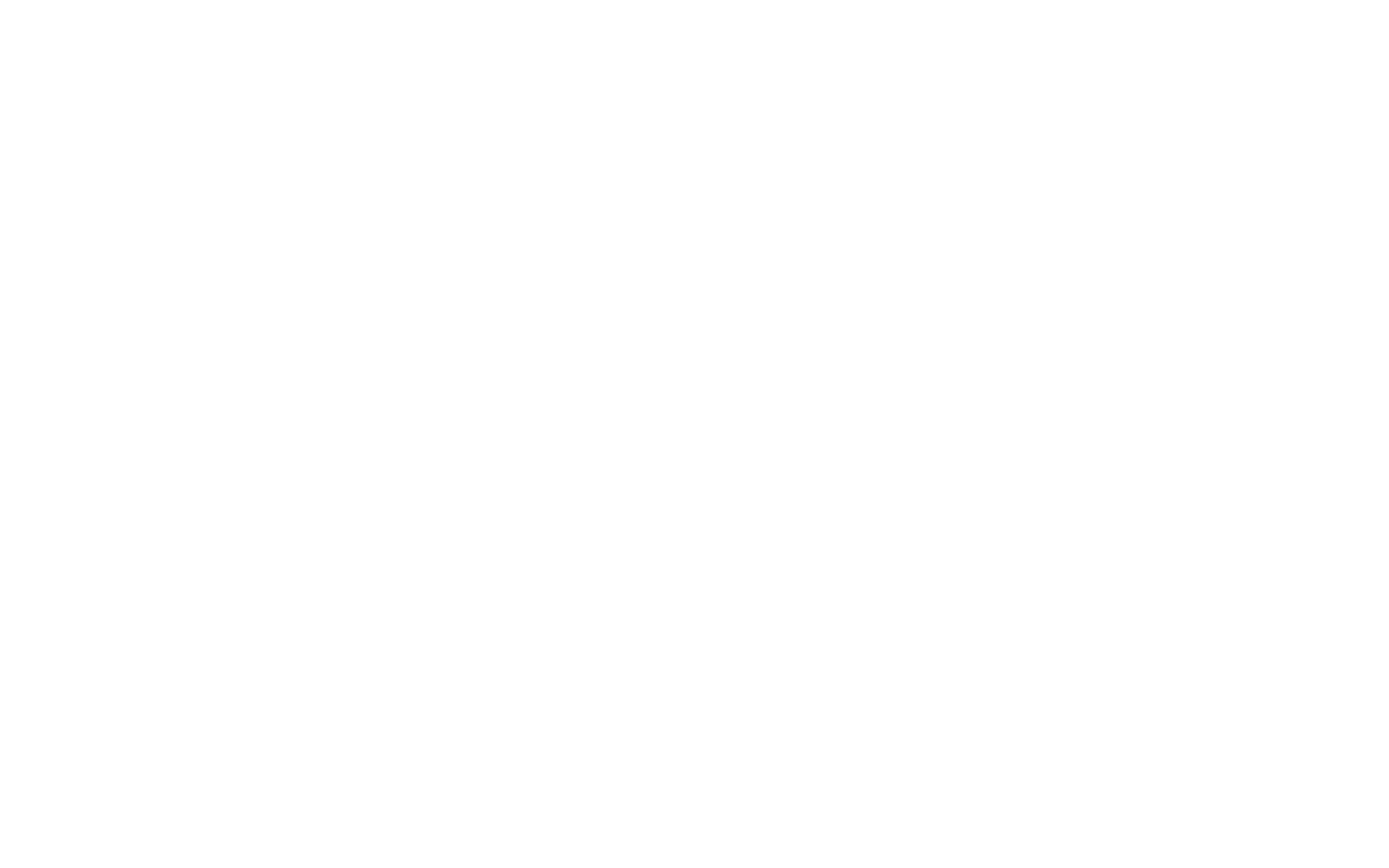2010년 7월 24일에 저장한 글입니다
그날의 생각 2010. 7. 24. 05:21 | 근래에는 두세시, 혹은 네다섯시에나 잠들어서 일어나면 낮 12시를 훌쩍 넘긴다. 늦은 점심이라기엔 이른 저녁을 아침으로 먹으면서 TV를 키면 케이블에서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를 재방송해주곤 한다. 몇 편을 보는 사이 재미가 붙어 직접 찾아보고 있다. 독특한 미션, 창작물의 제작과정과 고민들, 캐릭터들의 충돌과 같은 요소들이 재미있다. 산디과를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쇼를 보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자기긍정이 너무 부러웠다. 나는 디자이너라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옷들이 너무 많고 재능이 있다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과 애정이 묻어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된다.
근래에는, 정말로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다. 취미생활과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전부다. 누가 '너 지금 뭐하니'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다. 주변의 친구들은 다들 인턴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나는...
나는 석사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사실, 영어성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이번에 석사지원을 못 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방학동안 시험을 치루겠지만 성적이라는게 뜻대로 될까. 석사를 쓰는게 내년 여름이라면 가을학기 졸전을 마치고 영어공부에 매진한 뒤, 내년 상반기는 독립영화워크숍을 들으려고 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에는 영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년을 투자해서 아니라면 깨끗하게 돌아서고 좋다면 다 그만두고 군대에 가기로 다짐했다. 헌데 어영부영 영어성적이 충족되고, 석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CT에 가고 싶었다. KAIST에서 가장 덜 공대스러운 곳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CT에서 예술과 인문, 예술과 과학 사이의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도 글이나 영상, 전시에 대한 막연한 관심과 동경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쪽을 담당하는 랩이 축소되면서 내가 여기에 가서 그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고한 맵이 있는것도 아닌데 꿈꾸는 것이 아니었나. 혹시 5년 전부터 가고 싶었다는 이유만으로 CT를 계속 고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맞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더불어 내가 지금 '디자인 전공'이라기에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산디과 석사에서 디자인을 더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융합적인 학문은 그 다음은 아닐까. 하지만 우리학과 어떤 랩에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 랩 같은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고, 내가 산업디자인학과에 계속 남아서 배우고 싶은 디자인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 그리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학생으로 세상에 기생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다. 영화는.. 모르겠다. 석사 지원의 기회가 주어지니 이 시스템을 뛰쳐 나가는 일이 겁나는 걸까.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며 살고 싶은 건 아닐지도 몰라. 모르겠다 나도 몰라.
내가 무엇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끊임없이 회의하게 되는 시간들 속에서, 결정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샤워를 하다가,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번 뒤집힌다. 자기소개서도, 포트폴리오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멍하니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만 본다. '디자이너 여러분, 다음 미션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요 저는 디자이너 아닌데요. 미치겠다.
'그날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Light in a day (4) | 2010.08.01 |
|---|---|
| Put down the remote (4) | 2010.07.05 |
| 시간을 주지 않는 시간 (2) | 2010.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