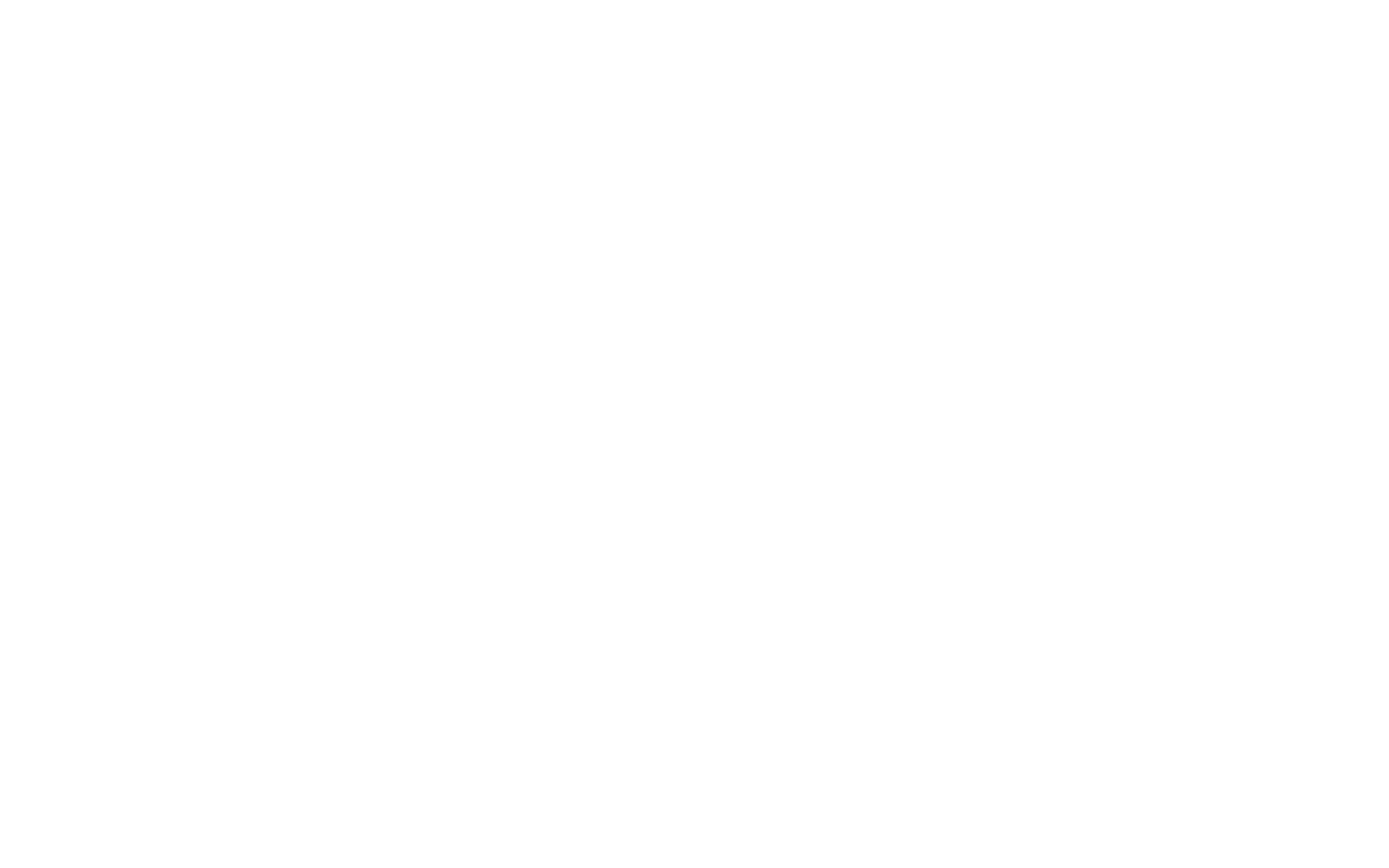오늘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잘 지내느냐고, 괜찮냐고. 부끄럽게도 나는 아주 괜찮다.
열 아홉, 스물, 스물 한 살에 친구들이 차례대로 죽었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들을 걱정했고 사람들은 괜찮냐고 위로했다. 친구들마다 아는 정도는 서로 다르겠지만, 나는 그 친구들이 죽음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막연한 짐작들은 기사로 퍼져나거나 장례식장을 낮게 채웠다. 상실에는 슬픔과 눈물이 따랐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온전히 마음이 무너지지도 못했다. 힘 내라는 사람들의 말에, 그 친구는 삶의 어떤 면에서 힘이 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힘을 내야 하는 것일까, 알지 못해 당황했다. 발인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돌아온 우리들은 서울역의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다. 잠을 설치고 감정적으로 지친 아침의 몽롱함 속에서 열심히 음식을 먹고 헤어졌다. 요즈음 그 순간의 풍경들이 자주 떠오른다. 깨끗한 테이블, 전망 좋은 자리, 어른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을까.
그 때 나는 그 친구들의 죽음의 이유도 알 지 못하면서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위로 받고 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내가 들어주지 못한 이야기로 마음 아파했을까봐, 이 모든 일에는 너의 몫도 있다고 원망하는 것만 같아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길에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고 계속 다짐했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멀어지면 연락이 뜸해질 수 있잖아. 그게 나의 잘못은 아니잖아. 스무살에 친구들과 만들다 만 영화는 이별한 사람이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질 거야'라고 말해주는 영화였다.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나 보다. 죽은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지금, 학교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짱을 끼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다. 나라면 못 견뎌냈을 거라고, 그들은 참 힘들 거라고, 난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고백하자면 그런 생각들도 했다.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에 올라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는 다시 스무 살 즈음으로 돌아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그 고민을 겪는 사람이 아닌데 내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고, 다른 상황에서 그 시간을 보내놓고 '괜찮아, 이겨내고 시간이 지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라고 쉽게 말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스무 살에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힘 내라고 했나 보다. 그 때 그들처럼, 지금 나도 여기에서 막연한 말을 하고 있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타자이기에 진짜 옆에 있어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정책이 개선된다고 하니 올바른 방향으로 물꼬가 틀어진 것 같지만 터진 아픔과 안으로 멍든 상처는 계속 남는다. 지금도 힘들어 할 누군가와, 그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힘들어 할 사람들이 다 아프게 다가온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액션을 보여야 하는지 나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열 아홉에서 스물 한 살 때, 내가 타자가 아니었을 때 나는 뭔가를 배우고 깨우쳐야 했던 걸까. 그 때 끝내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지금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텐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날의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일(2011) (1) | 2011.05.02 |
|---|---|
| 오고 가는 (3) | 2011.01.26 |
| 돌아보는 마음 (2010) (2) | 20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