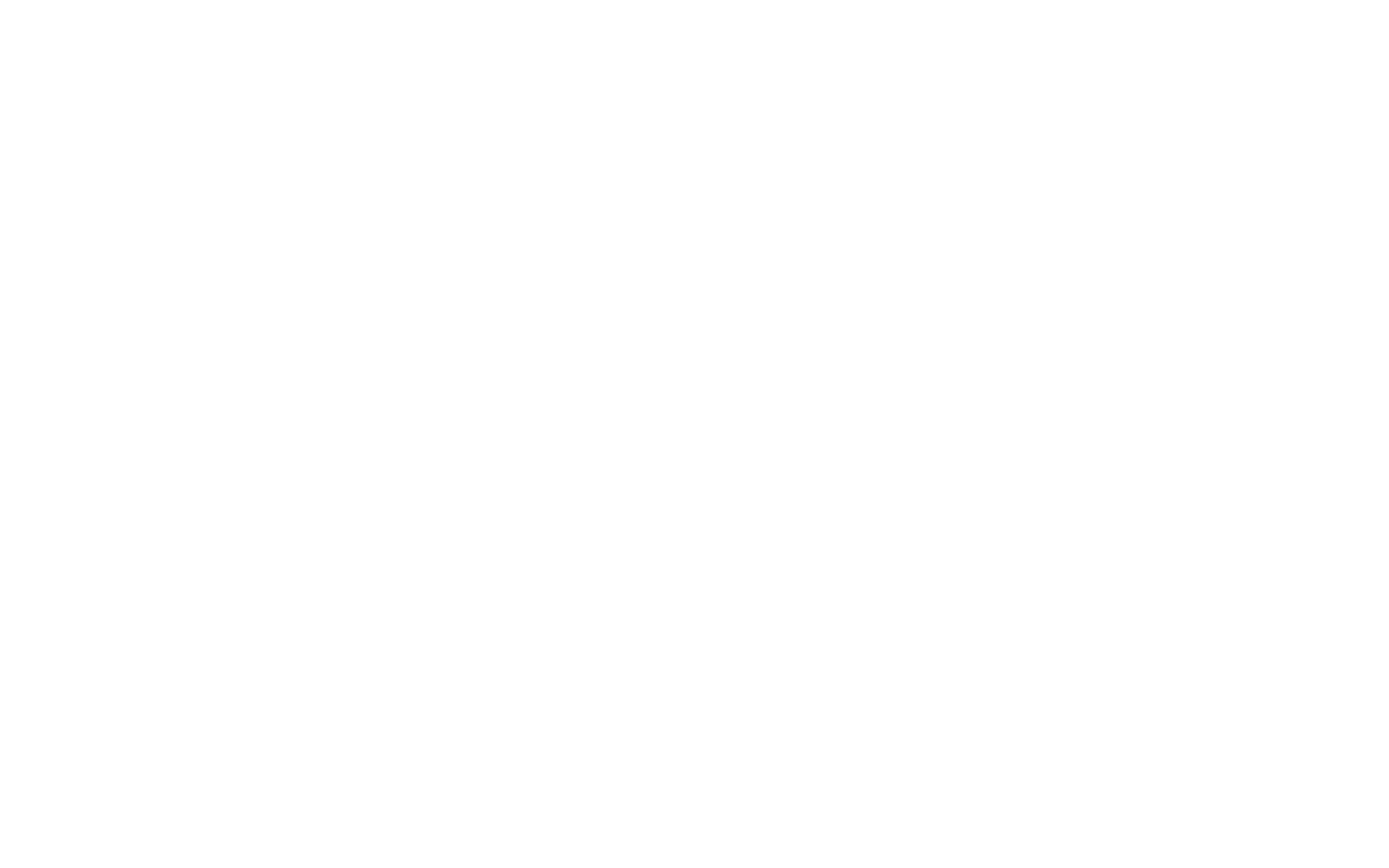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개의 학번 2010. 12. 26. 05:31 | 요즘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남는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한 채 머뭇거림으로 그치는 것들, 상대방을 생각하고 신경 쓰는 눈빛들이 오래도록 남아 여운을 준다. 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과, 끝이 무서워 수많은 예비 끝들을 치러내는 것과, 그럼에도 뒷모습을 보여주는 당신의 섭섭함과, 그런 섭섭한 마음 알지만 돌아설 수 밖에 없는 당신이 보여주는 마음들을 다 껴안고 싶다. 당신도 내가 보여주지 못한 마음을 눈치채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나는 행복해 할지도 모른다.
Y는 '우리 그 동안 너무 많이 끝을 치러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작년에 광화문에서 본 전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표준적인 졸업식으로는 그 동안의 쎈 경험들과 적절하게 작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쎈 시간들과 추억들을 쉽사리 보낼 수 없을 거다. 자꾸 돌아보고 마음 쓰여 할 거다. 이마저 오래된 칭얼거림처럼 지겹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제 서울이다. 그 동안 대전은 도망치고 싶은 공간이었다. 어제 아침에 기숙사에서 일어나 처음으로, 그냥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와 같은 말을 하려다가도 머뭇거린다. 그 다음에 이어질 말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삶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점을 굳이 확인하는 일이기에, 외면하듯 부산하게 짐을 싼다. 고삼때의 마음, 산티아고에 도착해서의 마음... 아마도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간 더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때마다 이렇게 마음 쓰여 할 거다. 맞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에 익숙해져야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처럼 쉽게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당신과 맞이하는 이 순간은 처음인데.
대전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외할머니 댁에 들렀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시간이 날 때 찾아 뵈어야 한다는 말에 애교부릴 줄 모르는 손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퉁퉁 부은 손등을 쓰다듬고 건조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할머니의 역사와 추억들과 삶들을 상상한다. 죄송해요. 자주 오겠다는 거짓말 같은 말을 못하겠어서 건강하시라고 말할 뿐이었다. 아무 말 없는 나를 보고 Y형은 '그래, 네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걸 알아도 말하는 마음에 미안하고, 듣고도 쉽게 말 못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형의 마음에 고마웠다. 할머니는 내 마음을 알았을까. 나는 얼른 죽어야 된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나를 조금 잃었다.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은 점들이 너무 많다. 자꾸 그것을 모방하다가 이렇게 헤어지고 나면 허무해진다. 아, 사실은 그마저 좋았다. 졸전을 생각하고 왔는데 일년 지나고 남는 건 전혀 다른 거였어.
'세 개의 학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자인하는 마음 (5) | 2011.02.13 |
|---|---|
| Thank you ID KAIST (2) | 2010.12.09 |
| Design Shower id KAIST Graduation Exhibition (4) | 201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