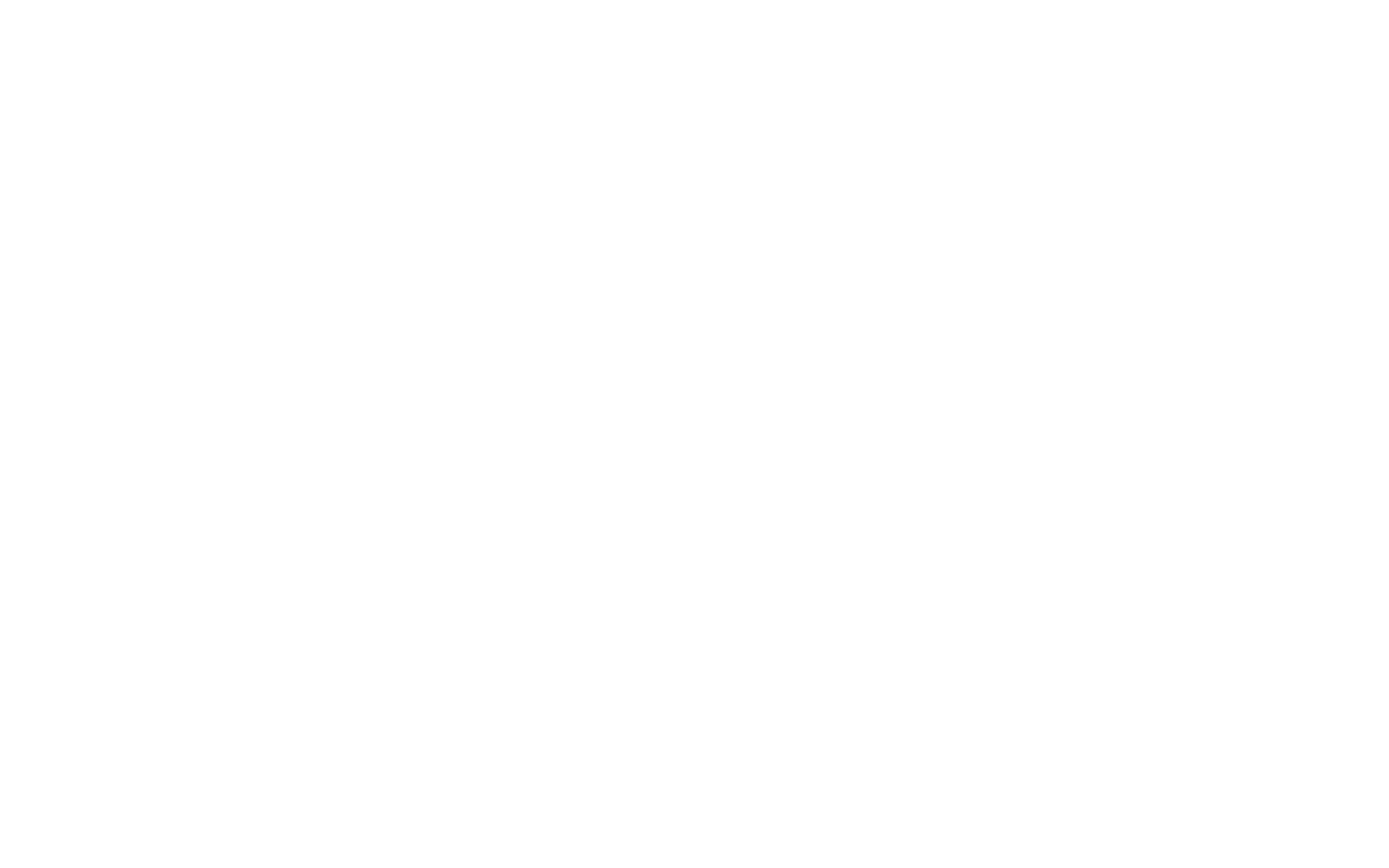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2
로드무비 2010. 2. 4. 11:39 |내가 가장 많이 걸은 길
런던에 집을 얻은 뒤로 나의 생활은 다시 원래의 리듬으로 돌아가서, 10시를 넘겨 느즈막하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가 시작될 즈음 집을 나선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직장인이라 낮 동안 집에는 나 혼자 뿐이다. 보통은 바게트에 어설픈 속을 넣은 샌드위치를 아침으로 먹으며 런던 여행에 대한 정보를 게으르게 수집한다. 우선 어딘가를 가보기보다는 런던을 걸으면서 이 도시의 길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싶어졌다. <론리플래닛 워킹 브리튼>을 들고, 런던을 걸어 여행하기로 한다.
집에서 나와 빅토리아 역으로 나가면, 수많은 직장인들, 여행객들이 그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기차와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부산하게 걷고 있다. 조금만 옷깃이 스치려고 해도 “Sorry”를 말하며 웃어 보이는 모습이 낯설었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습관적인 태도라는 느낌이 쉽게 전달되었지만 아무튼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좋다. 나도 “Sorry”를 말하며 걷는다. 마치 오래 런던에서 살았던 것처럼. <위키드>와 <빌리 엘리어트>가 상영중인 극장 사이로 끼어들어가면 여러 인종의 직장인들이 정장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거나, 사진기를 목에 걸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포함된다. PRET, 맥도날드,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를 거쳐 큰 도로 끝까지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국회의사당, 빅밴이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 말, 과학전람회 수상자 혜택의 일환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방문했던 게 나의 첫 유럽여행이었다. 여기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채 유명하다고 하니 그것들을 신기한 눈으로 봤던 것 같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을 두 시간 만에 보고 나왔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때는 그런 이국적인 곳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더 인상적이었다. 셔틀버스에서 내렸을 때 다른 느낌의 건물들, 사람들, 풍경들이 주는 충격.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5년 만에 다시 찾았을 때도, 그 사원보다는 여기에서 사원이 한 눈에 잘 보인다며 가이드 아저씨가 내려주셨던 공중전화박스 옆의 길목이 더 나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찍을 때, 나는 이쪽에서 그 길목과 공중전화박스를 찍었다. 이후에 여행을 하면서 예전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갈 때도 그 유적 자체보다는 그 장소에 도착했던 순간의 내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더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나는 한 달 동안 이 곳을 여행할 것이니 이런 관광지에서 신난다는 듯 사진을 찍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길을 걷는다. 마치 그런 내가 더 우월하다는 듯이, 이런 것들 것 나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사소하다는 듯이. 템즈강을 건너는 다리에서는 언제나 작은 충돌이 있다. 조잡하게 만든 꽃을 선물하듯 안겨주고 나서는 구매를 강요하는 사람, 튀긴 땅콩이나 아이스크림 등을 파는 사람, 스코틀랜드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런던아이나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며 카메라를 들이미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이리저리 피해서 빠르게 걷고 있자면 약간의 점프를 곁들인 댄스를 추는 것만 같다.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내려가면 런던아이를 시작으로 템스강을 따라 런던을 가로지르게 된다.
런던의 첫 날 원래는 이 길을 따라 런던 브릿지까지 걸어갔다가 오려고 했다. 몇몇 유명한 건물들을 보면서 걷는 코스를 론리플래닛에서 추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변을 따라 절반도 걷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해야 했다. 거리예술가들의 작은 공연들을 거쳐(찰리 채플린을 흉내 내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리예술가였다) 도착한 사우스뱅크 센터(SouthBank Center)와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있는 BFI (British Film Institute) 극장이 내 발걸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아주 현대적이라 유적지만 찾아 다니는 대부분의 관광책에서 외면하는 곳, 거대한 정보를 담아야 하기에 짧게 언급되고 마는 론리플래닛이 짚어주지 않은 보석이 여기에 있었다. 수많은 무료공간과, 디자인 숍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넓은 휴식공간이 되어주는 SouthBank Center와 미디어테크, 겔러리, 서점, 독특한 시네마테크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BFI는 나에게 선물 같은 공간이었다. BFI에서부터 조금 더 걸어가면 테이트모던(TateModern)에 다다르는데, 빅토리아역에서부터 템즈강을 따라 테이트모던까지 이르는 길은 한달 동안 런던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걷는 동네 산책로이자, 가장 습관적으로 향하는 길이 되었다. 마치 광화문에서부터 종로3가에 이르는 거리처럼.


사우스뱅크 센터의 뒤뜰에서는 Slow food market이 열리고 있고 BFI에서는 오시마 나기사 특별전과 sexploitation 특별전, 원닷제로 특별전이 연달아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영화나 공연 값은 거의 2배를 넘을 정도로 비싼데, 또 한편으로는 무료 공연과 전시도 널려있다. BFI 극장에선 픽사의 '업' 3D상영과 함께 감독과 제작자의 Q&A가 있는 티켓을 15달러에 파는데(비싸도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극장 1층의 미디어테크는 전부다 공짜인, 그런 식이다.
주변에 기회는 널려있는데, 또 이 방에서 모니터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지만, 패스트푸드의 노예가 되기도 쉽다. 이런 식의 자유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두근거리면서도 신난다. 내일은 뭘 할까? 도시를 여행한다는 건 또 이렇게 다르구나.

오늘 SouthBank Center에서는 무료공연으로 Thomas Truax라는 뮤지션의 공연이 있었는데, Must See라고 되어있길래 보기로 했다. Thomas Truaxs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악기로 연주를 하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현대적인, 그런데 재치 있고 진지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였다. 기이하게 분해하고 재조립된 물건들을 집어들 때마다 어떤 소리를 만들어 낼까 흥미를 자아내고, 그 악기들로 기본 리듬을 연주한 뒤 그 소리를 즉석에서 레코딩해서 바탕 리듬으로 깔고 새로운 악기로 소리를 덧입히면서 노래를 완성하는 작업이 재미있었다. 연주 도중에 객석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연주회장 밖을 한 바퀴 돌아 들어오기도 한다. 이 재치 있는 음악가의 음악은 듣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연주하는 실황을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이런 음악이 이런 공간에서 연주될 수 있는 환경이 멋있었다.


집에 입주한 날의 오후에는 조금 더 걸어 BFI까지 갔다. 영화비는 꽤 비싸고 시간이 맞는 작품이 없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미디어테크(www.bfi.org.uk/mediatheque)에 들어갔다. 얼마 동안 이용할건지 말하면 그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헤드폰을 건네준다. 지정된 자리에 가서 미디어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이미지, 영상, 단편들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매 시즌, 월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 놓아서 이 리스트를 따라 보는 것 만으로도 재미있다. 미디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모아 태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꺼내보고 유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에 감동받았다.
미디어테크에서 "The Kiss in the Tunnel(1899, James Bamfort)" "Flying the Foam and Some Fancy Diving(1906, James Williamson)" "Women's Rights(1899)" "The Tocher(1938, Lotte Reiniger)" "Mary's Birthday(1951, Lotte Reiniger)" "Rush Hour(1982, Nick Nicholls)" "Border Line(2005, Alex Chandon)" "Jack the Papper(1963)"과 "Top of the pops 78(1978)"등을 봤다. Nick Nicholls의 작품은 리듬이 재미있었고, The Kiss in the Tunnel을 비롯해서 고전 단편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 시절의 분위기나 유머가 사랑스럽다.
Ps. 한국에 돌아와 검색해보니, 놀랍게도 BFI미디어테크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250개가 넘는 클립을 공개해 놓았다. 재미있었던 두 클립을 올려본다. 관심이 있다면 (혹은 런던에 갈 수는 없는데 심심하다면) BFI 미디어테크 유튜브 페이지(http://www.youtube.com/user/BFIfilms)에서 오래된 필름과 미디어를 구경하는 것도 좋겠다.
Rush Hour (1982, Nick Nicholls)
The Kiss in the Tunnel (1899, James Bamfort)
'로드무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celand Film #01 (9) | 2010.04.08 |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1 (16) | 2010.02.02 |
| 런던에서 사는 듯 여행하기 (4) | 2010.02.01 |